[신간]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 윤영호 지음.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어차피 죽는 것 아무렇게나 죽어도 될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야 할까? 그리고 죽음은 그저 개인의 문제일까?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인 저자는 '죽음'으로부터 '삶'을 들여다본 32년 동안의 통찰을 책에 담아냈다.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지켜본 저자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삶이 끝난 뒤에도 삶이 계속되는 '역설적 희망'을 이야기한다.
'좋은 삶(웰빙)'은 '좋은 죽음(웰다잉)'으로 완성되며, 죽음은 삶을 완성할 단 한 번의 기회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죽음을 준비하면 할수록,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명확해지고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간병 살인과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법'과 '제도'가 국민의 죽음을 통제하는 한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지적하고, '광의의 웰다잉'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락사 합법화' 요구의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안타레스. 260쪽. 1만5천원.
![[신간]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KR20211130081400005_01_i_P4.jpg)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안에는 두 곳의 민간인 마을이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 즉 대한민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쪽, 즉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그것이다.
대성동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있는 마을로, 판문점이 지척이다.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겉보기일 뿐,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고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저자는 이 마을을 각종 사료와 주민 인터뷰,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더불어 제3땅굴, 판문점, 임진각 등 안보관광으로 소비되고 있는 지역의 역사도 살펴본다.
대성동은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1953년 8월 3일에 조성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완충지대이자 선전마을이었다.
현재 47세대가 사는 이곳에 가려면 임진강, 민간인통제선, DMZ 남방한계선 등 삼엄한 차단선을 통과해야 한다.
책은 '대성동, 누구의 땅도 아닌', 'DMZ 첫 마을', '대성동의 탄생', '대성동 주민으로 살아가기', '대성동 사람들', '대성동 인근 돌아보기' 등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대성동의 지리적 배경, 들어가는 길과 마을 풍경, 마을 탄생의 역사, 주민들의 삶, 인근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
소동. 288쪽. 2만원.
![[신간]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KR20211130081400005_02_i_P4.jpg)
자유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원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찾기 어려운 이유는 또 무엇인가?
1984년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태어난 저자는 한창 공부할 중학교 2학년 때인 1999년 1월,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 후 남은 식구들을 구하러 두 차례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던 끝에 극적으로 탈출했다.
저자는 2001년 6월, 가족과 함께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기구에 진입해 탈북자로서는 최초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남한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캐나다로 이주해 지금까지 그곳에 살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우리, 같이 살아요'로 출간됐으며, 이번에 제목이 바뀌어 새로이 복간됐다.
열아홉. 450쪽. 1만7천원.
![[신간]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KR20211130081400005_03_i_P4.jpg)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하이브, 민희진 등 오늘 고발…대화록 등 물증 입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1961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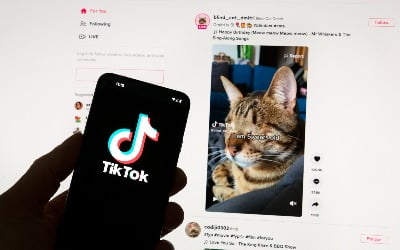
!["샤넬 백은 못 사도"…핫한 2030 언니들, 여기 다 모였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345.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