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난민 출신' 구르나 노벨문학상…"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한 통찰"
장편소설 10편 펴내
대표작 '파라다이스'
난민으로 겪은 혼란
작품 전체에 관통
소잉카 이후 35년 만에
아프리카 출신 문학상
"멋지고 경이롭다"
수상 소감 밝혀
![[책마을] '난민 출신' 구르나 노벨문학상…"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한 통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01103.1.jpg)
스웨덴 한림원은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구르나를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하고 연민 어린 통찰이 수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림원은 “구르나는 난민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에 집중해온 작가”라며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문화와 대륙 사이에서의 틈, 과거의 삶과 새롭게 떠오르는 삶의 틈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안데르스 올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구르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탈식민지 작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르나는 1948년 탄자니아 자치령인 잔지바르섬에서 태어났다. 잔지바르는 1963년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까지 빚어진 갈등으로 소수 민족 학살극이 벌어졌다. 아랍인과 인도인, 페르시아인들이 탈출 행렬에 나섰고, 구르나도 1960년대 말 가족의 품을 떠나 난민으로 영국에 도착했다. 그때 그의 나이 18세였다. 1984년이 돼서야 그는 잔지바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 구르나는 최근 은퇴할 때까지 영국 캔터베리에 있는 켄트대에서 영문학과 탈식민주의 문학을 가르쳤다.
21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의 모국어는 스와힐리어였지만 작품은 영어로 썼다. 아라비안 나이트와 코란이 초기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긴 했지만 그의 문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V S 나이폴 등 주로 영문학 작가였다. ‘혼란스러운 동아프리카인의 삶’은 그의 작품에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주제다. 첫 소설인 《출발의 기억》(1987)에서 주인공은 황폐한 고향을 떠나 케냐 나이로비의 부유한 삼촌 집으로 가려 하지만 좌절하고 만다. 두 번째 소설인 《순례자의 길》(1988)은 영국에 정착한 탄자니아 난민의 삶을 그렸다. 세 번째 소설 《도티》(1990)는 영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다.
네 번째 소설인 《파라다이스》는 그의 대표작이다. 1994년 영국 부커상(현 맨부커상) 최종 후보(쇼트리스트)에 올랐다. 한림원은 “《파라다이스》는 성년에 관한 이야기이자 서로 다른 세계와 신념 체계가 충돌하는 슬픈 러브 스토리”라고 평가했다.
구르나는 지난해 발표한 《애프터라이프》를 포함해 10편의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출간했다. 한림원은 “진리에 대한 그의 헌신과 단순화에 대한 혐오가 인상적”이라며 “그의 소설은 정형화된 묘사에서 벗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아프리카에 대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구르나의 수상은 아프리카계 흑인으로는 1986년 나이지리아 출신 월레 소잉카 이후 35년 만이다. 한림원은 ‘미투’ 스캔들로 2018년 수상자 선정을 1년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진 후 지리적·성별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폴란드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연기된 2018년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이 수상했다.
![[책마을] '난민 출신' 구르나 노벨문학상…"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한 통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01765.1.jpg)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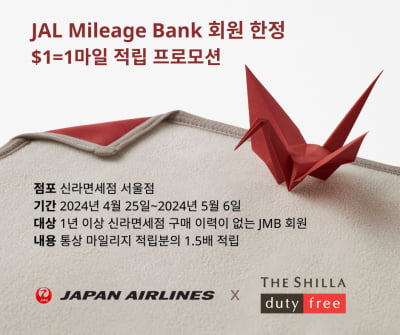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54783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