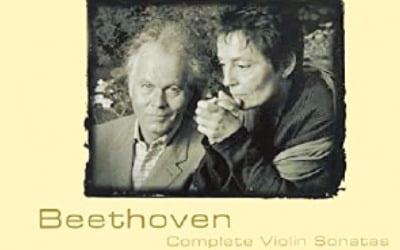"'피아노의 조상' 하프시코드 선율 들어보세요"
24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피아노·하프시코드 번갈아 연주
정제되고 간결한 선율 돋보여
바로크 시대 귀족음악의 특징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안종도(35·사진)는 하프시코드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의 조상’으로 불린다. 피아노가 등장하기 전 바로크 시대의 독주악기로 각광받았다. 한 번에 여러 음을 짚을 수 있고 음량도 풍성해서다. 그가 피아노와 하프시코드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인다. 오는 24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독주회에서다. 무대 위에 피아노와 하프시코드를 나란히 올려놓고 두 악기를 연달아 연주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색다르다. 바로크 시대를 상징하는 바흐의 곡을 택하지 않았다. 바흐의 레퍼토리는 주로 종교적인 색채를 지녔다. 현재도 '구약 성서'란 별칭이 붙는다. “이번 공연에선 인간을 향한 연주를 하고 싶었어요. 세속적이지만 인간 본질을 드러내는 레퍼토리를 골랐죠.”
이날 공연 1부에서는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 루이 쿠프랭의 ‘클라브생 모음곡’을 하프시코드로 연주하고, 곧이어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와 ‘피아노 소나타 b내림장조’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하프시코드로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 요한 야콥 프로베르거의 작품을 연주하고, 피날레에선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를 선사한다.
하프시코드의 연주 방식은 피아노와 다르다. 하프시코드는 가죽으로 된 고리로 악기 안에 있는 줄을 뜯어서 소리 내는 ‘발현악기’다. 줄을 망치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피아노와 달리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다. 악보는 간결하다. 강세를 알려주는 지시문이 없어서다. ‘포르테’(강하게), ‘크레센도’(점점 강하게) 등의 기호나 지시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연주자는 오로지 자신의 감에 의존해야 한다.
“악보에 음표 말고 지시문이 없어 애를 먹었죠. 당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해석하려고 문화 사조부터 연구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사교계의 취향과 문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맥락을 유추해냈어요.”
안종도는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다. 2012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올랐고 ‘최고의 독주회상’과 ‘최고의 현대음악 연주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콩쿠르 우승 후 그는 2017년 독일 브레멘 음악대학에 진학했다. 고(古)음악과 관련된 문화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포르테 피아니스트 리처드 이가에게 하프시코드를 배우고 있다.
피아니스트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하프시코드는 낯설었다. 그는 스승 앞에서 처음 하프시코드를 연주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연주를 들은 선생님이 ‘여기가 베르사유 궁전이었다면 넌 비난 받을 수도 있다. 마치 농부의 아들처럼 연주하는구나’고 말씀하셨죠. 당시 귀족사회의 매너와 가치관이 연주에 녹아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어요.”
역설적이게도 피아노 실력이 걸림돌이 됐다. 피아노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하프시코드를 연주할 때는 절제해야 한다. 계몽주의가 대두되기 전인 17세기에는 개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시대였어요. 눈을 가리킬 때도 직접 말하지 않고 ‘영혼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던 시기죠. 음악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절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올해 서른다섯. 콩쿠르 경력을 밑천 삼아 후학을 가르쳐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학생이다. 그는 “시도할 것이 무궁무진해 평생 배워야 한다”며 “하프시코드로 오페라도 연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독주회를 마친 뒤 그는 7월 함부르크로 돌아갈 예정이다. 함부르크 음악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어서다. 음악가와 미술 작가, 역사학자가 한데 모여 축제와 포럼을 여는 ‘북독일 클랑아카데미’도 준비할 예정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음악이 흐르는 아침] 프랑스 교향시의 명곡…생상스의 '옹팔의 물레'](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0961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