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하지만 낯선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탐색하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
프랑스 사회학자 다비드 르 브르통 저서 '걷기 예찬'에 나오는 글귀다.
자동차가 일상화하면서 이동 수단으로서 두 발의 용도가 축소되는 시대를 우리는 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걷기에 대한 사람들 관심은 더 높아진다.
세 학자가 100년 전 지도를 들고 현재의 거리를 걷는 여정에 나섰다.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박진한 소장과 이연경·문순희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각각 역사학과 건축학, 문학 전공자인 이들 학자는 1918년의 '인천' 지도를 들고 2018년에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 인천의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신간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는 그 결과물이다.
이들은 경이로움과 설렘을 가지고 1918년과 2018년의 시간차가 빚어낸 풍경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비교했다.
과거의 풍경이 현재의 풍경과 겹치며 만들어내는 시간의 흔적들. 각자의 전공을 최대한 살려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온 변화를 새롭게 읽어내고자 했다.
"100년 전 지도를 들고 현재의 거리를 걷노라면, 옛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풍경 속에서 100년 전 사진 속 오래된 건물과 가로, 석축과 계단 위에 남겨진 100년 전 모습이 드문드문 눈에 들어왔다.
"

청국조계(租界)와 일본조계, 각국공원이 있던 북성동·선린동·송학동을 비롯해 조선인의 일상이 새겨진 신포동·내동·답동 등지를 찬찬히 돌아봤다.
이와 함께 일본인 묘지에서 조계 외곽의 신시가지로 탈바꿈한 신흥동·율목동·사동, 유흥과 휴양의 명소로 부상한 월미도, 조선인 노동자들의 애환어린 삶이 남은 북성동·송현동 등지도 살폈다.
인천은 다른 개항도시와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청국조계, 일본조계, 각국조계가 병존하며 조계 밖 한국인들과 경합하고 충돌하며 개항도시를 만들어갔다.
본래 중국의 전통음식이었던 짜장면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짠맛에서 단맛으로 재탄생한 것은 개항장의 문화 충돌이 빚어낸 대표적 발명품이었다.
1923년 여름에 개장한 월미동 조탕(潮湯)은 바닷물을 데워 입욕하는 해수탕으로, 개업 첫날부터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풍광 좋은 바닷가에 마련된 조탕을 중심으로 1927년에는 유원지 시설이, 1930년에는 호텔이 들어서면서 월미도 유원지는 서울 근교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여름 피서지로 명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인천 곳곳에서도 기억하고 남겨야 할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저자들은 안타까워한다.
예컨대 2012년에는 아사히 양조장이, 2017년에는 애경사가, 이어 최근에는 신일철공소가 철거됐고, 신흥동 문화주택 역시 소리소문없이 어느 날 사라졌다.
책에서 언급한 미쓰비시 줄사택 역시 철거를 눈앞에 뒀다.
이번 책은 개항 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형성된 의미 있는 장소들 위주로 편성했다.
물론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진 인천의 도시 경관도 만난다.
저자들은 "이 장소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 작업에서 우리가 지양하고자 한 것은 이 장소들이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었다"며 "지나온 시간의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새기되 지나친 낭만주의나 민족주의로 지나온 과거의 특정한 단면만 부각시켜 일종의 역사 소비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한다.
북멘토. 한국근대문학관 기획. 308쪽. 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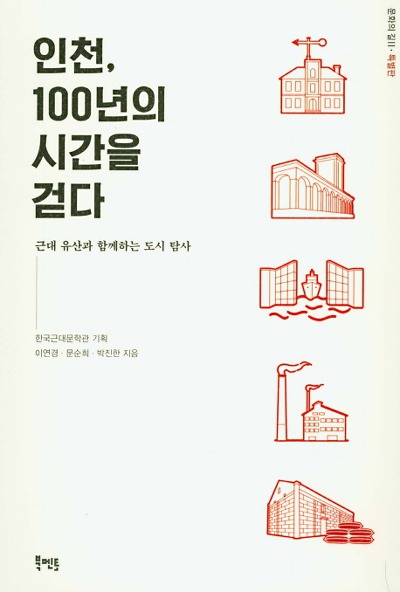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기상청 "대마도 북북동쪽 인근 바다서 규모 4.0 지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4834.3.pn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