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비추는 한줄기 빛 믿고 따라가듯 詩 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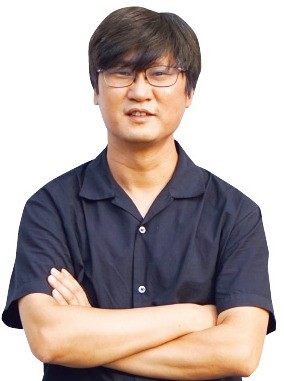
다작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문장이 시집 《한 문장》에서부터 크게 변화했다. 시(詩)라는 장르의 특징인 함축성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보폭은 아주 좁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음 문장을 조리 있게 써 나아간 그의 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시인은 “예전엔 문장 하나를 쓰면서 여러 문장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라 함축적인 시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문장 이후 다음 문장만 생각나도 다행일 정도로 호흡이 바뀌었다”며 작법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써 오던 스타일로 시를 쓰는 게 나도 지겹고 독자들도 지겨워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2014년 문예중앙잡지에 ‘발바닥 소설’로 연재한 글 가운데 시로 소개해도 될 만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한 문장》과의 차이가 있다면 서사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행과 연의 구분이 없고, 2~3페이지씩 이어지는 시도 많다. 농축된 언어를 쓰는 시의 습성과 이야기가 살아 있는 산문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독특한 시집이다.
‘칼맛을 아는 자와 살맛을 아는 자가 만나서 싸웠다.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서 칼맛을 아는 자가 말했다. 내 살을 남김없이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맛이야. 인정! (…) 살과 칼은 서로를 맞물고 놓지 않았다. 마치 천생연분인 것처럼 각자의 집을 허물고 한 집에 붙어 살았다. 칼집이 아니면 살집인 그 집에서.’(‘칼맛과 살맛’ 중)
김 시인은 “《한 문장》이 ‘전격’이라면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파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가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처음 발표할 땐 에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라는 장르로 소개됐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언어’라는 주제에 천착하는 그의 시적 주제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있다’ ‘중’(《한 문장》 수록) 같은 시에서는 그만의 기발한 문장실험이 눈에 띈다. 김 시인은 “이 세계는 언어로 치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가 B의 뺨을 때렸다’는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A는 “살짝 어루만졌다”고 말하고, B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세계를 구성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계는 곧 언어에 의한 세계라는 점에서 첫 시집 이후 언어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23699.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