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깨기 실험' 주목받는 연출가 김태형
"이전엔 없던 것, 새 힘 더해진 작품 만들고파"
즉흥 뮤지컬 등 파격 시도
연극 '카포네…', 뮤지컬 '팬레터' 등 섬세하고 빈틈 없는 연출 호평
"TV예능 등에서 소재 포착"

마음이 향한 곳은 연극이었다. KAIST에 자퇴서를 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들어가 연출을 공부했다. 2007년 연극 ‘오월엔 결혼할 거야’로 데뷔했다. 30대 초반엔 “빌빌거리면서” 살았다고 한다. 연출 일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아 무대에 조명을 다는 일이나 수험생 수학 과외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최고의 흥행 연출가로 손꼽힌다. 연극 ‘글로리아’ ‘모범생들’ ‘히스토리 보이즈’ ‘카포네 트릴로지’,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아가사’ ‘로기수’ ‘팬레터’ 등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드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 관객들이 현장에서 선택한 주인공과 상황으로 즉석에서 장면과 노래를 만드는 즉흥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을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극장 전체를 공연장으로 만들고 관객이 마치 롤플레잉게임(RPG) 캐릭터처럼 미션을 수행하며 공연을 체험하는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원탁에서 맥주를 마시며 카바레쇼를 보듯 즐기는 뮤지컬 ‘미 온 더 송’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예능프로그램, 영화, 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에서 ‘엇!’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선한 질감을 포착할 때죠. 그러면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고 기억해둡니다. 존재하는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합할 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연출은 글자로 구성된 희곡에 숨을 불어넣고 공연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김태형은 섬세하고 빈틈없는 연출에 능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연출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탄탄한 논리에서 나오는 설득력”이라며 “돌이켜보면 어릴 적부터 해온 수학문제 풀이와 공식 증명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논리적 훈련 과정이었다”고 했다.
“뭔가를 증명하려면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논리적으로 얼마나 완전한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집요하게 이런저런 길을 탐색해보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는 훈련이 돼 있다는 게 연출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무대에서 뭔가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쌓아가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죠.”
그는 ‘낡지 않은 연출’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해가 갈수록 더 새롭고 세련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이전에는 없었던, 또는 존재했던 것이라도 새로운 힘이 더해진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도 그의 화두다. 그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형식을 항상 고민한다”며 “사회와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균열을 가하는 작업에 오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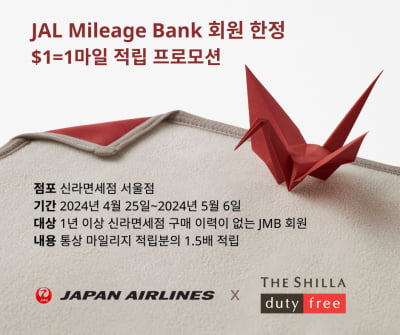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54783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