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몰고온 '예술의 대중화'…한국의 '두다멜' 나올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땐 위화감도 느껴진다. 클래식이니 미술이니 잘 모르지만, 한 번쯤 듣거나 보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포기하고 만다. 시간도 돈도 그런 데 쓸 여유가 없다고 현실이 속삭인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겠거니 한다. 그러나 이젠 집 안방에 있는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나도 그 연주 봤어. 야닉 네제 세갱 지휘가 진짜 훌륭하던데. 모네 작품도 가까이서 보니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
구글의 ‘아트 앤 컬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이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보여주니 해외 공연, 전시장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 객석도 아닌 무대 위에서 360도로 돌려보며 연주자들의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미술관에선 직접 거닐 듯 움직이며 작품을 하나씩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70여 개 나라의 600만 개 공연, 작품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같던 ‘예술의 대중화’는 다양한 영상 기술과 플랫폼 발전으로 전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고급 예술로 분류되는 클래식, 오페라, 미술 등은 더 이상 즐겨본 사람만이 아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적 감성의 연결고리를 대중문화에서 찾아야 했던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 이 간극을 줄일 장치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견고하기만 했던 문화적 격차와 불평등은 이제 그 틈을 메울 무언가를 찾아낸 듯한 분위기다.
첨단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술을 쉽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네이버에선 클래식, 뮤지컬 등 특정 공연의 실황을 1~2회에 걸쳐 생중계한다. TV 드라마를 보듯 때를 맞춰 기다렸다가 ‘네이버TV’에 접속만 하면 된다. 예술의전당은 무대에 오른 공연을 녹화해 영상으로 제공하는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 말 시작 이후 누적 관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영화관 메가박스에선 해외 유명 오페라를 스크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
예술의 대중화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격차와 불평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사회계층과 계급 간 골은 더욱 깊어진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저서 《구별짓기》를 통해 “화폐자본이 아닌 문화자본이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문화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을 뜻하는 ‘아비투스(Habitus)’란 개념도 만들어 냈다. 아비투스는 타고 나지 않는다. 사회적 위치, 교육 환경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자신만의 취향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문화적 취향이다.
이는 현대에 들어와 더 큰 차이를 만들어 냈다. 제조업 이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창의성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 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적 감성과 직관은 여전히 특정 계층의 것이다.
물론 이 견고한 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예술과 개인을 ‘연결’해 주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자신도 몰랐던 감성과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쿡 찔러주는 것이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연결해 준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천부적인 감각은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보와 악기를 쥐여 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다.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은 ‘싹 온 스크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울릉도의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소녀는 군민회관에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봤다며 이렇게 적었다. “태어나서 발레를 처음 봤어요. 저도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섬에서 한국판 두다멜을 꿈꾸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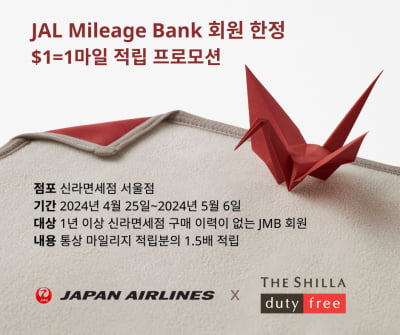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54783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