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빛이 보이나요?…류경채의 추상을 추억하다
1960~1995년 제작한 색면추상 등 50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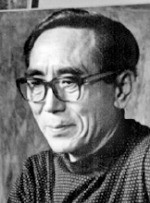
평생 무욕의 정신으로 자연을 노래하다 간 서정적 추상화가 류경채(1920~1995·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좋아했던 미국 색면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한마디가 겹쳐진다. “풍경을 그리면서 화폭을 지워보니 오히려 원하는 그림이 됐고, 슬픔과 절망의 세상이 숭고한 추상으로 물들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인 류 화백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추상미술의 개척자로 불린다. 동시대를 살았던 김환기·박수근·이중섭·장욱진에 비하면 그는 신화가 없는 화가였다. 식민지의 그늘에서 천재 또는 기인으로 튀어오르거나 일그러지지 않았다. 형식과 타협을 거부하고 스스로 택한 고립과 은둔 속에 오로지 자연 앞에서 느끼는 ‘서정적 긴장감’으로 살았다.

서울 사간동 현대화랑이 새해 첫 전시로 ‘류영채의 추상회화 1960~1995’전을 내년 1월5일 개막한다. 1960년부터 타계하기 전까지 작업한 추상화 50여점을 통해 류 화백의 회화세계를 재발견하려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류 화백의 작품을 시대별로 풀어놨다. ‘1960년대 비구상’ ‘1970년대 순수 추상’ ‘1980년대 색면 분할’ ‘1990년대 기하학적 추상’이다. 초기에 풍경과 인물을 다룬 작품에 ‘목가’ ‘산길’ ‘녹음’ 등 제목을 붙이던 화가는 점차 ‘계절’ ‘염원’ ‘날’ ‘축전’으로 압축해 구체적 형상의 흔적을 제거하거나 생략하며 ‘읽는 시’ 대신 ‘보는 시’를 추구했다. 드뷔시가 회화적 음악을 시도했다면, 류 화백은 시적 회화를 꿈꿨다. 관람객의 내면을 사무치게 적시고,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시적 효과를 내려 했다.
서울의 풍경을 처음 추상미학으로 버무린 1960년작 ‘도심지대’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빌럼 더 코닝의 ‘검은 회화’ 연작을 연상시킨다. 목가적인 화면에서 보였던 따뜻한 풍경이 사라지고 검정색, 회색, 흰색의 색면으로 자연의 숭고함을 시처럼 형상화했다. 류 화백이 생전에 “서울 전체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수많은 붓질을 해도 되질 않아 한번 화폭을 지워봤지. 그랬더니 바로 내가 원하는 서울의 이미지가 되더라니까!”라고 했던 그 그림이다.
‘여일’ ‘백일’ ‘날’ 등 시간과 관련된 작품도 관람객을 반긴다. 대패질하듯 자연의 흔적을 지워내며 현란한 빛과 시간의 움직임을 잡아낸 작품들이다. 그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빛을 형상화하려 고심했다. 하나의 주제를 마음속에 시처럼 읊고 이내 그 소리를 빛으로 치환해 화폭에 풀어냈다고 한다. 그림 제목에 ‘날’이라는 제목이 많은 까닭이다.
1990년대 초 민주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겪은 한국 사회 풍경을 삼각형, 사각형, 원형의 구도 안에 가두려 한 작품들도 주목된다. 분홍색, 흰색 기운의 기하학 색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중시 사상을 담아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도형태 갤러리 현대 사장은 “류 화백은 한국적 추상미술 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자신조차 색을 통해 해석하려 했다”며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2월5일까지. (02)2287-3585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23699.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