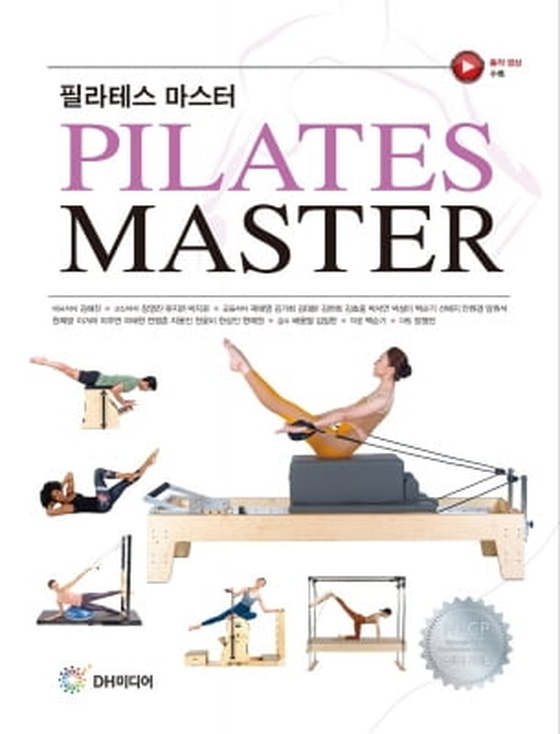조각도 유물처럼…땅속에서 발굴
4일부터 갤러리 마리서 개인전

이씨가 4일부터 서울 신문로 갤러리 마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3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시간을 머금은 순서’. 땅속의 기와나 도자기 파편 등 유물을 마사토와 시멘트로 섞어 시간의 흔적을 잡아낸 어린 왕자, 모자상, 노트북, 의자, 곰인형 등 37점을 내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를 깎거나 돌을 쪼고, 주물이나 용접 등으로 금속을 조형화하는 기존 조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먼저 땅 위에 드로잉을 하고 흙을 파낸 다음 그 속에 퇴적암과 기와, 칠보석 등의 파편을 깔고 모래와 반죽한 시멘트를 채운다. 다시 흙을 덮어 일정 시간 굳힌 뒤 이 시멘트 형상을 ‘고구마 캐듯’ 조심스럽게 캐낸다. 황토물을 입히거나 눈과 코, 입술 등의 표정을 그리면 작품이 태어난다.
이씨는 “시멘트 작품의 매장과 출토 과정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경계를 넘어 우리 고유의 미의식을 찾는 일”이라며 “목수였던 아버지에게 들은 여주 고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발굴 조각 기법을 창안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테라코타 작업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당시 발굴 작업이 이뤄지던 고달사지 인근 농가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신라 경덕왕 때 지은 고달사의 문화재 발굴현장을 보며 땅속에 묶인 유물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과거를 작품에 담아내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 땅에 묻은 역사를 다시 캐내는 특유의 조형기법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거푸집이 무너지거나 작품 형태가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애를 먹었죠. 혼합재료의 정확한 비율을 찾는 데만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2005년 작업실을 경기 양평으로 옮긴 그는 초기의 불상이나 동자상 작업에서 벗어나 순박한 현대인의 표정을 잡아내는 데 집중했다. 신라 토우의 해학미와 원형미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시간의 나이테’를 잡아내려 경기 광주 가마터에서 가져온 백자 파편과 분청자 파편을 오브제로 활용했다. 현대적 재료인 시멘트를 사용하지만 작품은 1000년 세월을 지나온 유물처럼 예스럽다. 6월14일까지. (02)730-7300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