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근의 史史로운 이야기] 정조와 옹정제, 帝王의 욕설
조선 제22대 왕 정조(재위 1776~1800)가 신하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편지(密札)가 무더기로 공개돼 화제다.
통설과는 달리 정조가 훗날 자신을 독살했다는 노론벽파 영수와 기탄없는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고관들을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린다(鼓吻)"라든지 "호로자식(胡種子)" 같은 흐드러진 욕설로 메다꽂은 장면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
실로 처음으로 드러난 임금의 적나라한 언행에 현대인들은 적잖이 놀란 모습이다.
비밀편지를 정치에 널리 활용한 제왕을 꼽자면 단연 청(淸) 옹정제(재위 1722~1735)일 것이다. 그는 지방관들에게 정식 상주(上奏) 외에 일대일 밀찰 교환을 의무화했다.
주접(奏摺)이라는 것이다. 통치의 실상 파악이 목적이었지만 관료들의 횡적연합, 붕당(朋黨)을 막고 군주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더 활용됐다.
"짐은 45년간 세상의 쓴맛단맛 다 본 다음 천자가 됐다. 만만히 보고 덤볐다가는 호되게 당할 줄 알라." 즉위 제일성이 이 정도였으니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짐도 다 아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너는 눈도 귀도 없는 나무인형(木偶人)."
"이런 바보 같은 의견이 있나! 편지이기 망정이지 공문서로 보냈다면 너는 큰 벌을 받았을 게다. "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질펀한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바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下愚不移)는 말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은혜도 의리도 모르는 교활한 늙은이(老姦巨猾)."
"네가 신선이냐? 이렇게 한심하고 허황된 말을 늘어놓다니."
"어리석을 우(愚)자를 너무 많이 쓴다. 짐이 아둔한 놈에게 관직을 줬겠는가?"
"만일 이것과 다를 땐 네 머리가 제자리에 붙어있기를 바라지 말라."
주접은 지방관이 보낸 편지에 황제가 빨간 잉크로 답장을 덧쓰는 형식. 그래서 한 장에 담긴 대화가 필담처럼 생생하다.
지방관1 : 신은 스스로 그릇이 작고 재주가 용렬함을 압니다.
옹정제 : 자신을 한마디로 그려내는 재주, 한폭의 그림과 같다.
지방관2 :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옹정제 : 그렇게는 하지 말라.
황제는 때로 써올린 글귀 위에 줄을 긋고 이렇게 고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지방관3 : 지극히 '두렵고 황송함(戰慄惶悚)'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옹정제 : '부끄러워 식은 땀이 줄줄 흐른다(羞愧汗 )'로 바꿔라.
황제의 질책을 받은 당사자는 하늘이 노랬겠지만 후세의 우리는 군신간의 솔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절로 빙긋 웃게 된다.
"등불 아래 답장을 쓰느라 글씨꼴이 우스울 수가 없다. 그렇다고 비웃지는 말라."
하루에 20~30통, 많을 땐 50~60통이나 쇄도하는 편지를 빠짐없이 읽고 지체없이 답장하느라 황제는 매일 밤 자정을 넘겼다.
이렇게 재위 13년 동안 1100여명의 관료와 주고받은 편지가 2만2000통을 넘었고 집무실 양쪽 회랑에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40년 터울을 두고 제왕에 오른 정조와 옹정제는 닮은 점이 많다. 정조는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眼鼻莫開)" 바쁘다고 하소연했다지만, 옹정제는 천명이니 어쩔 수 없으나 '황제 노릇 힘들다(爲君難)'는 말을 좌우명 삼을 만큼 부지런했다.
'사대부의 천하'를 노리는 관료에 맞서 왕권강화를 추구한 정조나 절대군주제를 완성한 옹정제도 닮은 꼴이다. 옹정제가 이틀만에 급사하고, 원한을 품은 소녀자객의 칼에 당했다는 암살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애쓴 그들이 세상을 뜨자마자 믿었던 총신들에 의해 모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은 비극이자 한계였다.
우종근 편집위원 umbeco@naver.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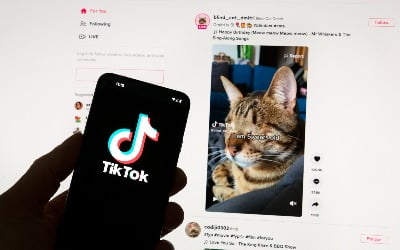
!["샤넬 백은 못 사도"…핫한 2030 언니들, 여기 다 모였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345.3.jpg)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3659.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