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8:42
수정2006.04.04 08:45
짠맛과 단맛의 대명사인 소금과 설탕.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백색 가루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무역전쟁의 기폭제이자 지구촌을 '하얗게 뒤덮은 세계 상품'이다.
'소금'(마크 쿨란스키 지음,이창식 옮김,세종서적,1만7천원)과 '설탕의 세계사'(가와기타 미노루 지음,장미화 옮김,좋은책만들기,1만원)를 함께 읽다보면 인류 문명사의 이면이 이 작고 하얀 결정체 때문에 얼마나 굴곡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소금은 음식 저장과 미라 제조를 위한 주요한 성분이었고,로마는 켈트족에 승리를 거둔 뒤 그들의 소금 광산에서 제국의 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소금의 국가지배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두 해안도시인 베니스와 제노바는 내륙 도시 파르마를 사이에 두고 '소금 무역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중세 때 프랑스 귀족들은 소금을 사치의 상징물로 여겨서 최고급의 소금은 식사하는 내내 주인이나 가장 귀한 손님 곁에 놓여졌다.
프랑스 대혁명도 소금폭동으로 시작됐다.
설탕은 주로 카리브해에서 생산됐지만 이를 위한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노예들이 수입됐고 소비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이뤄졌다.
설탕은 열병이나 기침 페스트 치료용 약품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고급 조미료와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전쟁의 주요인이 됐다.
카리브해에 설탕플랜테이션이 성립된 것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된 것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혁명 후의 영국에서 도시노동자들의 생활조건에 가장 적합했던 것은 홍차와 설탕이었다.
이 '영국식 아침식사'는 제대로 된 부엌이 없더라도 뜨거운 물만 끓일 수 있으면 준비가 가능한 음식이었다.
특히 설탕을 넣은 홍차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즉효성 있는 칼로리 보급원이었고 공장 노동자들의 에너지원이기도 했다.
콜럼버스가 서반구를 향해 떠났던 두 번째 항해에서 사탕수수를 가져갔던 것 역시 상품의 지배를 위한 전략이었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물가 잡으라는 말에 새벽 4시부터 시장 돌아다닌 공무원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165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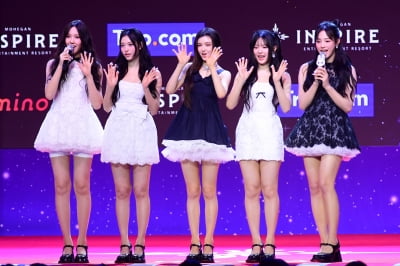


!["14억이 전기차 타야하는데"…인도, 리튬·니켈 확보전 뛰어든다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06152.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공연소식] 국립합창단, 내달 '한국 가곡의 모든 것' 공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125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