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방어낚시'] "왔다!...바로 이맛이야"
'투두둑...'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낚싯대의 미세한 진동이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에서 한차례 증폭된 뒤 고막을 때리는 것 같다.
오른팔을 90도로 접어 바닷물과 수평으로 잡은 낚싯대의 초릿대(줄을 연결 낚싯대의 끝부분)가 꺾어질 듯 아래로 휘었다.
팔꿈치에 느슨하게 걸어두었던 낚싯대의 굵은 손잡이 부분이 어깻죽지를 쳤다.
"왔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 나왔다.
거의 반사적으로 손아귀에 힘을 줘 낚싯대를 움켜 잡았다.
낚싯대는 이미 10cm쯤 끌려나간 뒤었다.
거의 놓칠뻔 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채 올려야죠. 손잡이 끝을 배꼽 근처에 밀착시키고..."
울릉낚시의 김도복씨가 소리를 쳤다.
왼팔을 뻗어 잡은 낚싯대를 끌어당겨 명치와 배꼽 사이에 밀착시키고, 힘껏 가슴을 젖혔다.
오른손은 더듬더듬 릴 손잡이로 가져갔다.
하늘로 치켜 올려진 초릿대는 거의 부러질 정도였다.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은 없었다.
단지 물위의 낚싯줄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수초나 바위에 바늘이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표정을 읽은 김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큰놈이 문게 확실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낚싯대를 채 올린 다음 내리면서 릴을 감아줘야 합니다."
끊길 것 같은 낚싯줄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무언가 낚기는 낚은게 틀림없었다.
동작이 서툴러 들어올린 낚싯대를 내리면서 릴을 감기가 어려웠다.
물고기를 낚는 것인지, 물고기에 낚인 것인지 모를 정도였다.
그렇게 5~6분.
수면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려진 커다란 물고기가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게 보였다.
푸른 등에, 하얀 배를 가진 60cm 크기의 방어였다.
낚싯대 손잡이 부분을 댄 배와 팔 전체가 알이 밴 듯 얼얼했지만, 처음 나선 바다 선상낚시에서 맛본 '손맛'의 후련한 느낌은 길게 이어졌다.
울릉도 방어낚시가 제철을 맞았다.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춰진 요즘이 절정.
11월 초까지 손맛은 물론 마리수 재미도 덤으로 얻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그야말로 '물 반 방어 반'이다.
오징어 '똥창'(내장)을 미끼로 꿴 릴 낚싯대를 드리우기만 하면 팔뚝만한 방어가 연이어 올라 온다.
'히라스'라 부르는 물고기도 낚인다.
히라스는 방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노란 띠 모양의 옆줄이 등과 배 사이에 나 있고, 뒤쪽 작은 등지느러미도 약간 다르다.
횟감으로 방어보다 더 쳐주는 어종이다.
송곳산과 코끼리바위 그리고 삼선암의 풍광이 그림같은 울릉도 천부 앞바다에서 이날 잡아올린 것만 해도 20여마리.
그중 히라스가 네댓마리를 헤아렸다.
갯바위낚시를 즐기는 바다낚시 '도사들'을 포인트마다 내려준 다음, 초보자 예닐곱명이 시작한 1시간30분여의 조황으로는 대만족.
'지구를 낚은'(물밑 바위나 수초에 낚시바늘이 걸렸을 때 하는 우스갯소리) 사람 또 미끼를 새로 끼우기 위해 낚싯대를 들어올리다 옆구리에 바늘이 걸려 나온 자리돔을 보고 괜히 쑥스러워 한 이도 옆사람을 거들며 방어낚시의 손맛을 만끽했다.
잡아올린 방어는 즉석에서 피를 뺀 뒤 회를 떠 먹기도 하는데 도심의 횟집에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맛이 일품이다.
배위에서 하는 낚시인 만큼 배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흔들려도 멀미를 하거나 컨디션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게 없다.
바다낚시라면 도가 트인 전문가들이 그날의 포인트중에서도 '장판'(파도가 잔잔하다는 뜻의 은어)인 곳만을 골라 안내해 준다.
김도복씨는 "울릉도에서의 선상 방어낚시는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 한마리를 낚더라도 그 묵직한 손맛에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릉도=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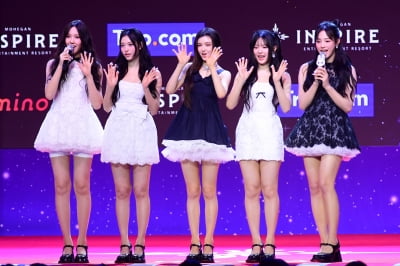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