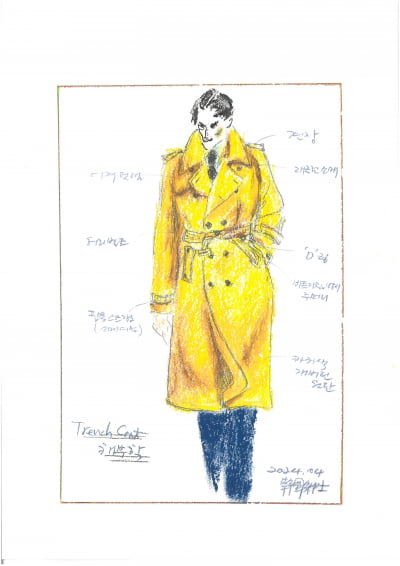입력2006.04.02 20:14
수정2006.04.02 20:16
여름도 거의 다 지났다.
한바탕 쏟아진 폭우에 '등줄기를 훅훅 볶던' 늦더위가 싹 씻겨 내렸다.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를 지나 더도 덜도 말았으면 좋은 건들팔월의 한복판, 한가위를 앞두고 있다.
꿔다가라도 일으킨다는 칠월장마가 길고도 독해 여기저기 남겨진 생채기가 아리긴 하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법한 정치권과 해바라기 인물들의 행태를 하릴없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도 영 개운찮다.
훌쩍 떠나보자.
강원 평창, 그중에서도 봉평이 좋겠다.
가산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고향이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 허생원'의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 잔잔하면서도 가슴 벅차게 반전되는 이야기가 거기 살아 있다.
효석마을이 그 중심이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츱츱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아'
대화장으로 한몫 잡으러 일어서는 허생원 조선달 동이, 소설속 그 세사람의 체취가 단박 전해지는 마을이다.
30년대 두메산골의 소박한 자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밀꽃이 매개체다.
가산의 흉상과 시비가 있는 가산문학공원 바로 옆 개울을 넘어서면서부터 허리아래 세상은 하얀색으로 바뀐다.
대화까지 80리 밤길을 타박타박 걷다 본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한 가산의 묘사가 한치도 틀림없다.
관광객을 부르기 위해 매년 새로 꾸미는 메밀밭이지만 그 느낌을 방해하지 않는다.
차지게 씹히는 찐옥수수를 파는 벙어리 아주머니까지 소설속의 한 주인공 같다.
너른 메밀밭 앞 길가에 물레방아가 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숫기'도 없고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던' 허생원이 딱 한번 여자를 봤던 곳.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들어갔다.
봉평마당에서 제일가는 일색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던 그 물방앗간이다.
빛바랜 흑백사진에 솜씨없는 기술자가 색을 입혀 재주를 부린 꼴이지만 제법 단정하기는 하다.
물방앗간 바로 옆은 입을 투르르거리는 당나귀를 뒤에 두고 사진기 셔터를 누르는 사람이 여럿이다.
당나귀는 투전판에서 돈을 몽땅 날린 허생원이 팔아치울 생각까지 했지만 애끓는 정분에 이를 물고 단념했던 인생의 동반자.
'가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는 그 당나귀의 모습이 뭉개진 그림자 속에 비쳐진다.
언덕 위에 짓는 효석문학관(9월7일 개관)을 오른편으로 보내고, 깊숙이 들어가면 가산생가가 있다.
아버지를 따라 진부로 가기까지 여섯해를 살았던 가산의 탯자리다.
가산은 생가를 떠나 진부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올라와 경성제대에서 영문학을 배웠다.
결혼을 하고 처가가 있는 함북 경성을 거쳐 평양에 뿌리를 내렸다.
'메밀꽃 필 무렵'은 평양으로 이사한 이듬해인 1936년, 그러니까 결핵성 뇌막염으로 요절하기 6년전인 30살 때 '조광'에 발표한 작품.
가산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시기의 글이라고 한다.
다시 소설속으로 들어가 보자.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어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의 끝, 허생원의 발길은 제천으로 향한다.
제천은 가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들 동이와 성 서방네 처녀로 상징되는 잃어버린 꿈의 부활을 약속하는 희망의 땅이 아닐까.
그 꿈의 부활로 이어지는 긴 길가엔 요즘 소금을 흩뿌린 듯 하얀 메밀꽃, 연보랏빛 토종 야생화 벌(별)개미취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평창=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