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 떠들썩하게 찾아온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이 한국에 왔다.
유령은 음산하고 비밀스럽게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떠들썩하고 들뜬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무대에 도착했다.
2일 LG아트센터에서 첫 선을 보인 이 공연은 '한국 뮤지컬 역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로 이목을 끌었다.
역대 최고의 제작비(1백억원) 투입과 대극장 공연으로는 최장기 공연(7개월)계획을 세웠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그러한 수식어를 붙일 만 하다.
흥행의 귀재로 통하는 웨버의 작품 중에서도 '오페라의 유령'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장중한 음악,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 현란한 시각적 장치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작품은 웨버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호화로움을 보여준다.
작품의 서막은 초라한 경매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첫 무대는 앞으로 전개될 환상적인 장면들을 감춘 채 음산하고 조용하게 펼쳐진다.
마침내 경매품 중 하나인 대형 샹들리에에 불이 켜지고 장엄한 서곡이 연주되면서 그 찬란한 불빛이 관객의 머리 위로 솟아 오르면 관객들은 1800년대 파리의 오페라하우스로 빨려 들어간다.
이 작품은 드라마의 고전적 소재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주인공이 기괴하고 신비한 존재인 유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대는 작품 내용에 맞게 환상적이고 마(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유령이 머무는 환각적인 지하세계와 오페라하우스의 화려한 지상세계가 서로 교차되면서 무대 전체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태어난다.
무대는 두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모든 장면이 잠시의 지체나 주저함도 없이 한 순간에 바뀌곤 한다.
한 마디로 첨단의 무대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가장 눈에 거슬렸던 것은 주연급 배우들의 가창력과 연기력이다.
주인공 팬텀(윤영석 분)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안정적이지 못했다.
오프닝 무대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너무 젊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여주인공 크리스틴(이혜경)의 성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깨끗한 편도 아니었다.
이에 반해 무대 경험이 많은 조연급들의 연기력과 가창력은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 사라 브라이트만과 같은 영롱한 목소리를 요구한다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제압력을 지닌 연륜있는 유령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안이하게 스타 시스템에 의존해 온 만큼 두터운 뮤지컬 배우층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대형 작품을 장기 공연할 뮤지컬 전용 극장마저 없어서 원래는 콘서트 홀로 지어진 공연장을 개조해야 하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다.
이제 우리 뮤지컬계는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시점에 왔다는 느낌이다.
결국 떠들썩 하게 온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 뮤지컬 인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이 공연이 진정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평론가 김광선 (대진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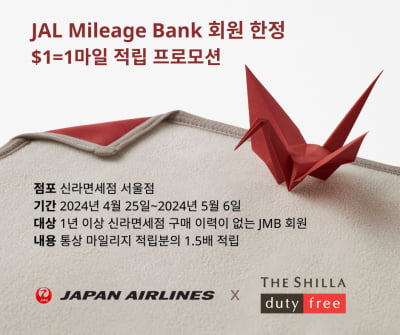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54783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