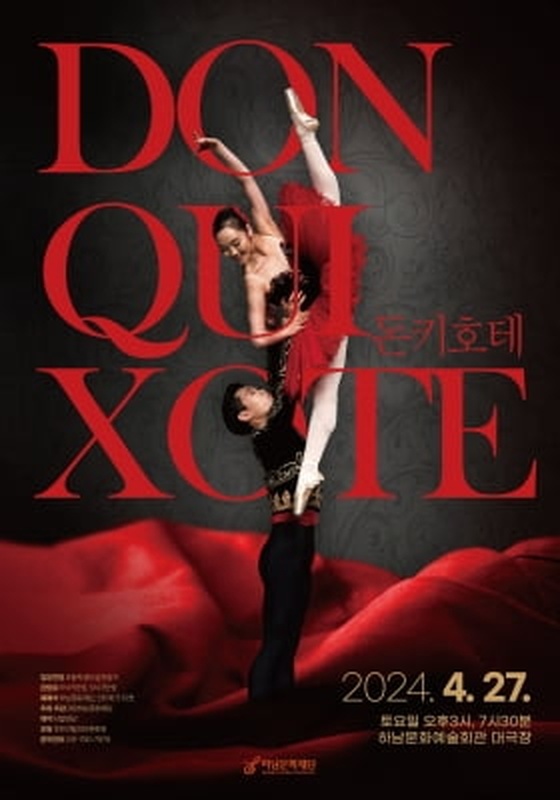30대에 주는 '길위의 깨우침' .. 윤대녕 장편 '달의 지평선'
태양은 "잘 깎아놓은 사과를 웬 나쁜 피를 가진 짐승이 소리 없이 베어먹는
모양"으로 일그러지다가 다시 비져 나온다.
오후 1시 그 여자는 옛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 그의 곁을 완전히 떠나 간다.
윤대녕(36)씨의 새 장편소설 "달의 지평선"(전2권 해냄)은 상실과 불화의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첫머리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화폭이 두시간 간격으로 포개져 있다.
하늘에서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지상에서는 어떤 빛깔들이 소멸되고
또 살아나는가.
작가는 상처와 결별의 땅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 먼 길을 둘러왔다.
두번째 장편 "추억의 아주 먼 곳" 이후 2년 6개월만에 펴낸 이번 작품은
그의 고백처럼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기록"이다.
그 여행의 길섶에는 상처입은 개인의 사랑과 지난 시대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주인공은 80년대의 상처를 색다르게 간직한 남창우.
그는 투옥된 운동권 친구 철하의 애인 은빈과 결혼했다가 5년만에 이혼했다.
로마로 떠난 은빈의 빈 자리로 서주미가 들어오지만 그녀도 일식이 있던 날
옛 남자에게 가버린다.
주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되짚어보다 과거로 돌아간 그는 긴 존재의
탐색여행을 통해 마침내 희망의 출구를 발견한다.
그것은 사람들과 불화했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과 고통의 밑자락에
닿아서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온전하게 껴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가 은빈을 찾기로 한 것도 "길 위의 깨우침"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절망의 생채기를 어루만지고 새 살을 돋게 하는 힘이 "슬픔을 오래
견딘 자"의 참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직하게 들려준다.
80년대의 흉터가 90년대를 성숙하게 하는 통과제의의 흔적이었다면 개인의
아픔 또한 성숙의 꽃을 피우는 거름이었다는 것.
반복적으로 차고 기우는 달의 원형 이미지를 지상의 수평 이미지와 겹쳐놓은
작가의 배려가 따뜻하다.
이는 곧 소멸과 생성의 과정을 우주와 합일시키는 작업이다.
그가 문학에 대한 고전적 감각과 90년대적 감수성을 동시에 지닌 작가로
불리는 까닭도 이때문일 것이다.
< 고두현 기자 k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스포츠 경기 베팅에서 36년 연속으로 돈을 번 사나이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1018.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