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주평] '로미오와 줄리엣'.. 90년대판 사랑얘기
하지만 불행은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삶이 고단할수록 어둡던 시절을 돌아보게 되고 희극보다 비극에 더
끌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눈물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간접체험에 의한 대리 만족.
셰익스피어시대라고 해서 달랐을까.
400년전 베로나에서 20세기 미국으로 무대가 옮겨진 90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한다.
캐플렛가의 파티에 몰래 참석한 로미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항속의 물고기에 넋을 잃고 있다가 줄리엣 (클에어 데인즈)과 눈길이
마주친다.
대저택의 실내 풀에서 나누는 사랑의 세레나데는 물소리처럼 투명하다.
"사랑은 깃털같은 거라고? 이렇게 난폭하게 나를 찔러대는데"
둘은 세인트메리성당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행복을 누리지만,
아직은 미완의 기쁨이다.
이들의 아슬아슬한 사랑 곁으로 양가 형제들의 싸움이 회오리치고,
"해변의 결투"를 막으려다 친구를 잃은 로미오는 줄리엣의 오빠를 총으로
쏜뒤 추방된다.
떠나기전 처음이자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는 어린 연인들의 슬픔이
아련하다.
강제결혼이 진행되자 줄리엣은 "하루분의 비약"을 먹고 가사상태에
빠지고 그녀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은 로미오는 납골당에 안치된 시신을
안고 오열하다 독약을 마신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곧이어 구슬픈 선율 사이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카메라는 부둥켜안은 두사람을 위에서 비춘다.
감독은 이 거대한 고전을 작은 TV화면에 담아 보여준다.
첫 장면과 라스트신을 브라운관으로 처리해 마치 뉴스처럼 전달한 것.
"액자영화"로 관객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도입부의 기괴한 난장과 중간중간 등장하는 해프닝들은 지나치게
할리우드식이어서 반감을 준다.
( 28일 서울 씨네하우스 뤼미에르 씨티 녹색 롯데월드 개봉 예정 )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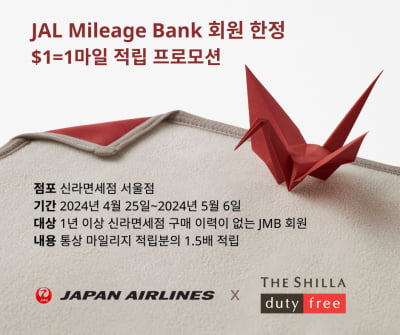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54783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