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배구조 전략적 변화' CBC그룹, 휴젤 놓고 고민하는 까닭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CBC그룹은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다. 지난해 8월 GS그룹, IMM인베스트먼트,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휴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블룸버그 보도대로라면 이들 콘소시엄은 휴젤을 인수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블룸버그는 국내 상장폐지 후 홍콩증시 재상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CBC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기사 등의 영향으로 휴젤 주가는 보도 당일인 전날 7.5% 급등했다.
휴젤 측은 하루 뒤인 이날 "최대주주에 확인해보니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휴젤의 최대주주는 지분 43.2%와 전환사채를 보유한 '아프로디테 홀딩스'라는 회사다. CBC그룹(42.1%)과 GS그룹·IMM인베스트먼트(42.1%),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사(10.5%)가 주주다.
투자자들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CBC그룹 등 휴젤 인수 주체들이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CBC그룹 등이 인수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젤 국내 상장폐지, 홍콩 재상장' 등 지배구조 변화 카드를 염두에 두는 배경은 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이다.
CBC그룹 콘소시엄이 지난해 8월 휴젤을 인수할 당시 적용된 주당 매입가격은 28만원이다. 현재 휴젤 주가는 12만원 수준으로 인수가 대비 반토막 이하로 낮아진 상황이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주가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자사주 5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등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CBC그룹이 휴젤 인수 이후 기업가치(주가)를 높이기 위해 어려 방면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블룸버그 보도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한수 CBC그룹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휴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나스닥 상장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CBC그룹 콘소시엄으로서는 국내 상장폐지 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훨씬 큰 미국과 중국 공략과 함께 현지에 상장하는 것이 기업가치 평가에 더 유리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지난해 중국에서 허가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미국은 연내 승인이 목표다.
다만 업계에선 휴젤의 국내 상장폐지 후 해외 재상장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일단 자금 부담이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CBC 콘소시엄의 휴젤 보유 지분은 43.2%다. 향후 보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을 고려해도 약 50%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휴젤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7000억원이 넘는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 부분 프리미엄까지 얹으면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진다. 기존 지분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만 이미 1조7000억원이다.
블룸버그는 CBC 측이 자금 조달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장 여건에선 외부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GS그룹의 보수적인 분위기도 이번 공개매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콘소시엄 안팎에서는 공개매수 진행 시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인 GS그룹 입장에서는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해외 재상장 등 일련의 과정이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기업이 특정 회사의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겠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상장폐지시키고 해외에 재상장하는 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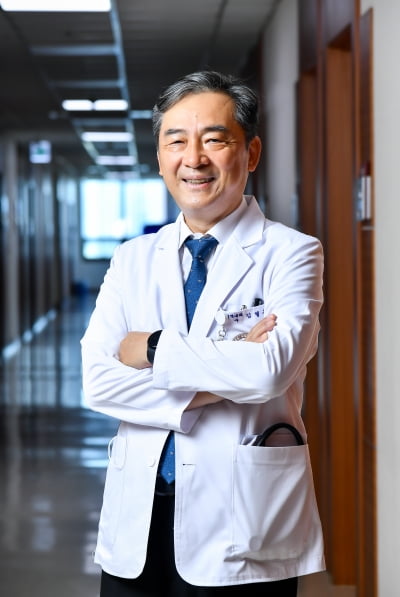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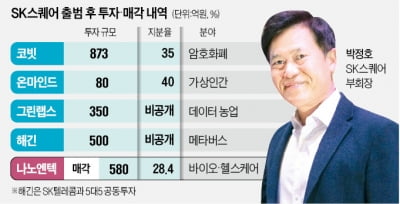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