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쓴 '응급실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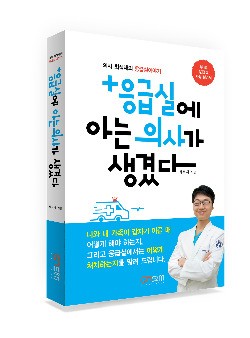
최석재 김포뉴고려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쓴 응급실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응급실 설명서다. 나와 내 가족이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자세하게 실었다.
10년 정도 응급실 의사로 지낸 저자는 요셉의원 의료봉사자,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들 사이 이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응급실 이야기’라는 소재로 블로그 글도 연재했다.
이 책은 저자가 겪은 다양한 환자들과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담았다. 응급실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혼잡함과 불편함 때문에 응급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레지던트로, 공중보건의로, 전문의로 응급실에서 지내온 저자는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무조건 대학병원만 선호하는 현상 등이 응급실 과밀화로 연결돼 환자 불편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을 통해 저자는 “응급실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경로로 방문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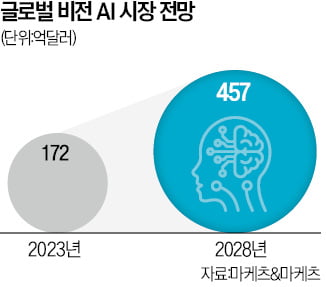












![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382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