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의 전자수첩] '불법은 숙명인가요'…'폰팔이'로 불리는 그들의 변(辨)
판매점은 싸다는 인식에 불법보조금 지원 불가피
![[이진욱의 전자수첩] '불법은 숙명인가요'…'폰팔이'로 불리는 그들의 변(辨)](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01.14096975.1.jpg)
폰팔이는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는 차팔이, 용팔이보다 더 악명이 높다. 휴대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금제, 번호이동, 지원금 등 복잡한 셈범에 따라 구입가격 편차가 큰 점도 한 몫했다.
실제로 폰팔이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할부원금을 속이기도 하고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 엉뚱한 제품을 팔기도 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현란한 말장난에 넘어가기 일쑤였다. "어이 언니 뭐 찾아?", "왜 그리 쫄았어", "오빠가 잘해줄게"라는 식의 불량스러운 호객행위도 이미지 악화를 자초했다.
2011년 스마트폰 붐이 일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극에 달했다. 이때 등장한 게 폰팔이다. 이통사들은 판매점에게 가입자 한명당 50만원 이상의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면서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때부터 가입자 모집에 혈안이 된 판매점들은 고객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공짜폰이라는 거짓 미끼가 대표적인 행태였다. 이후 소비자들 뇌리엔 '폰팔이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박혔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지원금에 법정 상한선을 두고 차별 지급을 금지한 것. 이후 악행을 저지르는 판매점들은 많이 줄었지만 폰팔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예전 그대로다. 이 때문에 나름 양심적인 판매점들까지 폰팔이로 매도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폰팔이라는 만들어진 프레임에 갇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8층.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였음에도 상가는 조용했다. 판매원이 자리를 비운 매장도 듬성듬성 눈에 띄였다. 간간히 지나가는 손님들을 불러세우는 '호객행위'도 없었다. 새 폰을 찾는 내국인보다 중고폰을 찾는 외국인들이 상가를 채우고 있었다.
"하루에 한 대 팔기도 힘들어요. 농담같죠?" 이곳에서 만난 휴대폰 판매경력 14년째인 A씨의 한마디는 판매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오늘이 평일이라서 손님이 이렇게 없는게 아닙니다. 주말에도 별 차이 없어요. 벌써 3년째 이런걸요"라고 말했다.
A씨는 판매점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데는 폰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고 했다. 그는 폰팔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심을 보였다.
A씨는 "아직까지 악의적인 영업점들이 있지만 양심적으로 소비자들을 대하는 판매점들도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라며 "고객에게 사기를 치는 식의 영업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판매점은 무조건 싸야한다는 선입견이 폰팔이 이미지를 악화시켰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A씨는 "소비자들은 우리가 합법적인 판매보다 더 싸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역시 폰팔이는 어쩔수 없다고 인식하는거죠"라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 판매점들이 법정 상한선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소비자들은 그 이상의 지원, 즉 불법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보조금의 재원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다. 이통3사는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모객 능력이 뛰어난 집단상가에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의 순수한 이익으로 일부를 소비자에게 떼어주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어디선 얼마를 깎아주더라'라는 식으로 흥정해오는 고객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한다.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판매는 커녕 폰팔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기 때문이다.
판매점의 경우 스마트폰 한 대를 팔면 대략 20만~30만원의 리베이트가 나온다. 번호이동은 물론 6만5000원대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다. 3만원대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엔 리베이트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리베이트를 그대로 남기면 먹고 살만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라며 "판매점 간 경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가격이 오픈되다보니 리베이트를 떼어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불법이 불가피하죠"라고 토로했다.

판매점들은 생존을 위해 일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법을 택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폰파라치' 때문이다. 2013년 1월 도입된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로 공시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불법 판매를 적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폰파라치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판매점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다. 게다가 폰파라치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판매점들로선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증거를 입수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지역 판매점 직원 C씨는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가만 부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라며 "폰파라치가 아니었다면 영업적으로 손해인 경우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타격이 크니까요"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리베이트 액수도 그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대구에서 판매점을 4년째 운영중인 D씨는 휴대폰을 팔고 손해를 본적도 있다고 했다. 손님과 계약한 후 리베이트 액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이득을 남기지 못했던 경우다.
그는 "이통사 측이 문자나 메일로 리베이트 액수를 책정해주는데 손님에게 판매를 한 후 확 줄어든적이 있었어요"며 "장사가 안돼 리베이트를 포기하면서까지 판매한건데 세금 10%까지 내고나니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였죠"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폰팔이로 불리는 판매점들은 대부분이 영세상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유통 종사자는 20만명, 점포 수는 3만7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롯데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등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로 쪼그라들었다. 문을 닫는 소규모 판매점들이 속출했으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다.
용산에서 10년째 판매업에 종사중인 E씨는 "친하게 지내던 주위 판매점들이 문을 닫을 때 참 속이 상해요. 제 미래일수도 있단 생각에 씁쓸하기도 하죠"라며 "힘든 시장 상황이지만 고객을 위한 영업을 하다보면 폰팔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휴대폰 판매업은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할 수 없는 직종이기도 하고요"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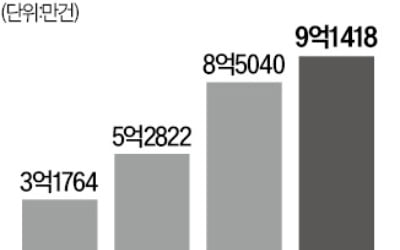











![[신간] 체코 국민작가 보후밀 흐라발 단편집 '이야기꾼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26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