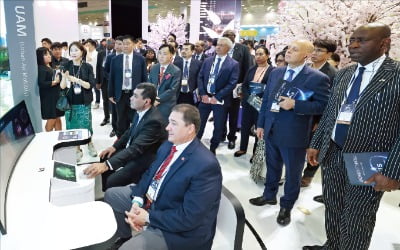GPS로 애인 위치 찾는 시대…그렇다고 '거짓말' 사라질까?
거짓말은 '편의' 위한 것 아닌 인간본성

톰 새디악 감독이 1997년 발표한 영화 ‘라이어라이어’의 주인공 플레처 리드가 한 말이다.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드는 극중에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 어떤 거짓말이든 서슴지 않는 악질 변호사로 나온다. 아들 맥스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 파티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맥스는 원망스런 마음에 생일 소원으로 아빠가 하루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소원이 이뤄져 리드는 정말로 하루 동안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리드가 겪는 상황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상황에서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는 탓에 성희롱 의혹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곤란을 겪는다. 의뢰인을 위해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던 그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말을 참느라 말더듬이가 돼버린 것.
◆거짓말은 진실을 부각시키는 ‘조연’
영국의 정치 분석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언 레슬리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란 책에서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회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거짓말’만 이 정도다. 별다른 의도나 의미 없이 하는 거짓말까지 합하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어떤 심리학자는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정도다. 기자의 일상을 돌이켜 봐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인터뷰를 끝낸 다음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거짓말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 라이어라이어의 리드처럼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기자부터 당장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 모를 노릇이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2009년 영화인 ‘거짓말의 발명’은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전화를 할 때 전혀 아프지 않더라도 “몸이 좋지 않아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면 상식이다. 영화 속 세상에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다. “어디 아픈가”라고 묻는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은 “아픈 게 아니라 당신 얼굴을 보는 게 싫어서 안 나갑니다”라고 답한다.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 마크는 이를 이용해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라이어라이어와 거짓말의 발명 모두 주인공이 ‘진실의 위대함’을 깨달으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지만 사실 ‘거짓말의 중요성’이 더 크게 와닿는다. 거짓말이 있기에 진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조연’인 셈이다.
◆진실 강제하는 시대
영화에서의 거짓말은 대개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 수단이 하나씩 늘어난다.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화상전화 등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했다.
재미있는 점은 소통 수단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코넬대의 제프리 핸콕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메일을 사용할 때 거짓말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은 인스턴트 메시지, 대면 순서였다. 전화로 통화할 때 거짓말을 가장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도 달랐다. 전화상으론 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와 같은 행동과 관련된 거짓말이 많았다. 대면할 때는 감정과 관련된 거짓말이 많았고 이메일은 주로 일과 관련해 거짓 변명이나 핑계를 들어 사정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연구의 결론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기술의 발전이 거짓말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은 역으로 진실을 강제하기도 한다.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는 현재 연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GPS 정보를 조작해 회사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거짓말은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란 생각까지 드는 게 사실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