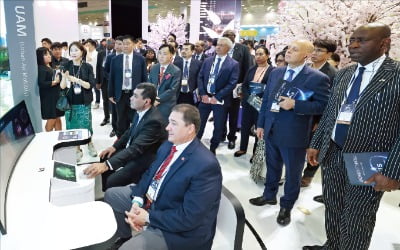입력2006.04.02 19:04
수정2006.04.02 19:08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 학번의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은 산업이 최전성기를 맞았을 때 사회 생활을 한 행복한 사람들이다.
60년대 초반 국내에선 섬유가 대표적 산업 가운데 하나였고 70년대 들어서는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화학산업이 본격화됐다.
화학공학과는 섬유와 중화학 두 개 분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학문이어서 당시 업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다.
화공과 졸업생들은 졸업 후 기업이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형편이었고 학생들 스스로도 '나중에 임원은 물론이고 공장장이나 사장도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학공학과는 전자공학과와 더불어 공대 가운데서도 합격선이 가장 높았다.
69학번 화공과 동기는 모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업계에는 홍기준 한화에너지 사장,김문철 BASF 사장 등이 있고 학계로 진출한 이로는 윤기준 성균관대 교수,주동표 아주대 교수,임경희 중앙대 교수 등이 있다.
KAIST와 KIST에도 총 7명의 동기가 교수로 재직중이다.
졸업할 때 동기는 50명이 있었다.
유학을 떠난 사람은 10여명뿐이고 대부분 취직을 택했다.
당시 동기들이 많이 간 회사는 동양나일론 한국나일론 등 섬유업체와 화학업체들이다.
나는 LG화학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LG석유화학 사장을 맡고 있는데 직장생활 내내 '내가 주류(主流)'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LG화학의 경우 지금도 임원의 절반 가량이 공대 출신이고 70∼80년대에는 그 수가 더 많았다.
제조업체에선 기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런 분위기였다.
구자경 당시 그룹 회장은 "공장장을 거치지 않고는 사장을 할 수 없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공대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선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 등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는 대세는 무시할 수 없지만 산업의 기초는 어떤 시대에든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화학이나 전자 등 인프라 관련 학문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
당장은 앞날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새로운 흐름에 응용·접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