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57
수정2006.04.02 19:00
서울대 공대가 신음하고 있다.
연구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다.
이공계 기피로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석.박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다.
그나마 연구실을 지키던 일부 연구원들은 어둠살이 퍼지기도 전에 귀가를 서두른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금융업체나 공무원으로 전직을 위해 또다른 공부에 매달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2002년 여름, 활력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국립 서울대 공과대학의 현주소다.
같은 시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선 훨씬 많은 공대생들을 만날 수 있다.
이른바 '고시 준비파'들이다.
대학 관계자는 "공대생의 20%가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과학도들과 경쟁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해야 할 공대생들의 육법전서를 외우며 고시에 혼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의대나 한의대로 가기 위해 자퇴나 휴학을 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공대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 한 귀퉁이에서 절망하는 선배들의 소식은, 서울대 공대생들을 휴학.전과 등의 유혹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공대를 보는 기업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입도선매(立稻先買)는 잊혀진지 오래다.
취직조차 쉽지 않다.
연구실적에서도 서울공대는 이름 값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구력 평가잣대인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2천5백91편(자연대 포함)을 실었다.
미국 하버드대(9천2백18편), 일본 도쿄대(6천4백39편) 등과 비교할 수없는 수준이다.
'특색없는 대학' '백화점식 학문분야'도 불명예스럽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미국의 MIT나 스탠퍼드, 캘리포니아공대, 하버드대 등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대공대가 안고 있는 숙제는 너무나 많다.
지금 서울공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서울대공대의 위기는 곧 국내 과학기술계의 위기다.
그 책임은 대학은 물론 정부, 기업 등 우리 모두에게 있다.
기존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과대학 육성책이 시급하다.
지금이 바로 서울공대의 '창조적 파괴'를 서둘러야 할 때다.
특별취재반 : 전화 (02)3604-265 이메일 strong-kore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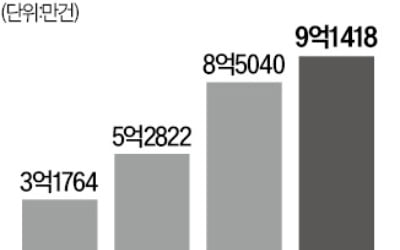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