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20
수정2006.04.02 10:23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의 한국 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IT기업도 'IT 코리아'의 동반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 수장답게 한결같이 엘리트다.
활동력 의사결정력 리더십 등 CEO의 기본 덕목도 두루 갖추고 있다.
파격적인 스타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독특한 경영 방식은 IT업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이들은 국내 IT산업 역사가 짧은 탓에 IT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글로벌 IT기업 한국 법인의 CEO 중에는 유독 IBM 출신이 많다.
'IBM 사단'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고현진 한국MS 사장(49), 김재민 한국유니시스 사장(50), 강성욱 컴팩코리아 사장(41)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IBM 맨'의 수장으로는 신재철 한국IBM 사장(55)을 꼽을 수 있다.
신 사장은 근무경력 23년만인 1996년 한국IBM 사장에 오른 정통 IBM 맨이다.
그는 IBM 맨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IT산업 선도자로서 색깔과 긍지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특히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빙모상을 당한 와중에도 어느 그룹 경영진 대상 강연 약속을 지킬 정도였다.
고현진 한국MS 사장은 전형적인 야전사령관 타입의 CEO다.
뒷짐지고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원들과 함께 뛴다.
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의 신상명세서를 끼고 다니기도 한다.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은행 한국IBM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거쳐 2000년 11월 한국MS 사령탑에 올랐다.
지난 84년 한국IBM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강성욱 컴팩코리아 사장은 대표적인 '성장론자'다.
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타고난 세일즈 감각과 강력한 리더십, 추진력을 내세워 공격경영을 펼친다.
98년 컴팩코리아 대표로 취임한 뒤 2년동안 매출을 3배로 늘리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명찬 인텔코리아 사장(47)과 최준근 한국HP 사장(49)은 공대 출신이고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토박이 CEO다.
글로벌 기업 CEO 자격증 정도로 여겨지는 MBA 졸업장도 없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점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김 사장은 LG상사(당시 럭키금성상사)에 근무하다 88년 인텔코리아로 옮겨 입사 12년만인 작년 3월 사장에 올랐다.
기술.영업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시장과 고객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의 스타일은 파격 그 자체다.
사장실도 없고 운전기사도 쓰지 않는다.
신입사원이 사장과 면접할 수 있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준근 HP 사장은 지난 84년 삼성전자와 휴렛팩커드가 합작 형태로 한국HP를 설립할 때 8년동안 다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한국HP로 직장을 옮겼다.
그는 95년 43세의 나이에 CEO로 발탁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의 목표는 회사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사회에서 존경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본사에서 3억7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본사를 설득해 직원들에게 1백% 격려금을 나눠 주기도 했다.
윤문석 한국오라클 사장(51)과 안경수 한국후지쯔 사장(50)은 국내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윤 사장은 77년부터 16년간 대우그룹에 몸담았다가 93년 오라클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겨 2000년에 CEO가 됐다.
그의 경영철학은 '참새론'으로 불린다.
'수백마리의 참새떼가 구름 흐르듯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방향을 거슬러 날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다.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보인다. CEO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윤 사장은 역설한다.
SAP코리아의 최승억 사장(45)은 경쟁사인 한국오라클 임원으로 일하다 발탁된 케이스다.
최 사장은 인재발굴과 전문가 육성을 중시한다.
"직원들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서다.
최 사장은 직원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는 CEO로 꼽히기도 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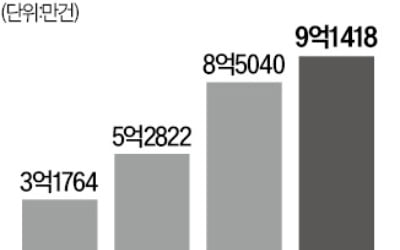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