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박에 스파이웨어 기업들 몸사린다
제품 개발·수출전 컨설팅받아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NSO그룹 경쟁사인 이스라엘 파라곤솔루션즈는 주력 제품인 그라파이트의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인 2019년부터 미국의 전략컨설팅회사인 웨스트이그젝어드바이저스를 자문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공동 창립한 이 회사는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댄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 등 버락 오바마 정권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력 인사를 여럿 배출했다. 파라곤은 배터리벤처스, 레드닷 등 미국 기반 벤처캐피털(VC)의 투자도 유치하며 미 정·재계와 밀착 관계를 강화해 왔다.
파라곤의 그라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신 스마트폰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고 와츠앱, 시그널 등 모바일 메신저의 암호화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파라곤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35개국을 중심으로 그라파이트 수출 계획을 짰다. 소식통들은 “대부분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 지원하에 1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인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NSO그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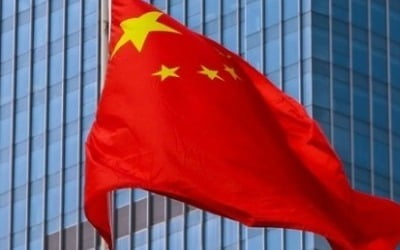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