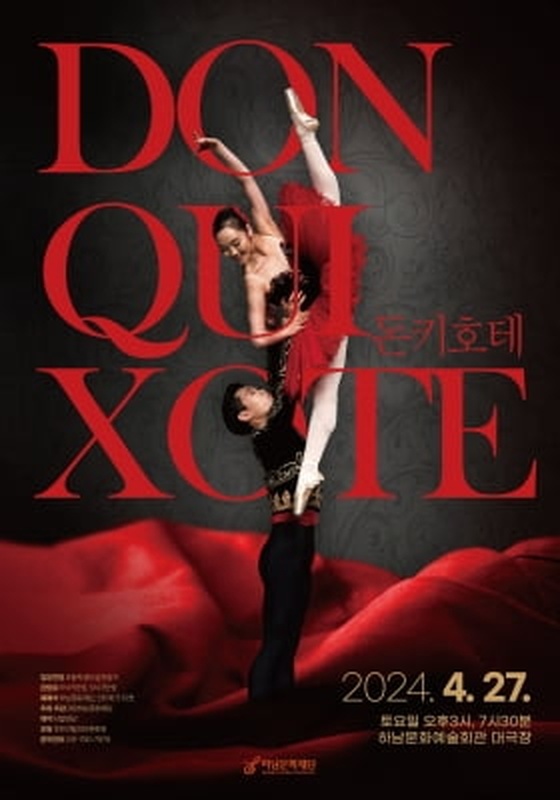바이든, 기후변화 공격적 목표 제시…중·러 동참유도 관건(종합)
650조원 대응 예산 확보 목표…소극적인 중·러·인도 설득전망에 비관론

전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 국제협력 과제로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배출 제로를 맞추겠다는 중간 목표를 내놨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적응·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REPARE) 구상을 통해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새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30억 달러를 투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회에 천문학적 금액인 5천550억 달러(654조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아직 통과하진 못한 상황이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인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해 1만2천500달러를 지원하고 가정의 태양광 설치 비용을 30% 가량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 청정 에너지 기술 강화 및 대규모 투자 ▲ 소외된 지역 사회로의 혜택 증대 ▲ 해양, 산림, 토양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연 복원력 강화 등이 들어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 교통 투자 ▲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대 ▲ 새로운 송전전 구축 ▲ 가뭄, 홍수, 산불 대응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미국으로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논의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지난 1월 취임 첫날 이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지나 매카시 백악관 보좌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왔다"며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를 결집시키기를 기대하며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통령 특사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전 세계 총생산(GDP)의 65%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며 바이든 취임 전인 1년 전과 비교해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COP26 회의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 수준으로는 최소 2.7도 상승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3~4위인 인도, 러시아의 공격적인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중, 미러간 갈등 고조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날 이탈리아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인해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COP26 대면 회의에 불참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상회의와 이후 2주가량 이어질 각국의 실무협상의 최종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결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엿볼 기회도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이란 관리 "즉각대응 계획없어…공격배후 불분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26473.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