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사모펀드 M&A 규모 '1290억달러'…"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회, 저금리 대출시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PEF 운용사들이 1290억달러 규모의 M&A 투자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 '넉넉한 곳간'에…"언제든 돈 쏠 준비 됐습니다"
자산운용시장이 경쟁상태에 놓이면서 운용사들은 기업인수를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대급 규모로 쌓인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를 '빨리 쏠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운용사들은 이를 위해 입찰 과정을 2~3개로 단축할 수 있는 사전입찰 등 인수대상기업에 미리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특히 테크·헬스케어 분야가 PEF 운용사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실제 올해 초 유럽계 자산운용사 아르디안이 독일 식품·환경·제약 분석전문기관 GBA그룹을 인수하는 데에 단 이틀이 걸렸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기업 유닛4와 세르바 헬스케어 등의 매각이 일사천리로 완료된 것도 역대급 속도의 입찰이었다. 지난달 독일 렌즈기업 로덴스톡이 유럽계 운용사 에이팩스파트너스에 18억달러에 팔릴 때도 입찰과정을 건너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은 물밑 인수 경쟁으로 매도자 우위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PEF 운용사들에 공개해도 기업가치가 폄훼될 걱정 없이 입찰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거래가 무산될 경우 해당 자산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원매자들을 새롭게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빠른 거래는 투자회사들이 전략적투자자(FI)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월 PEF 운용사인 베인캐피탈과 신벤은 독일 특수화학기업 랑세스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를 따돌리고 스위스 제약회사 론자그룹의 특수재료부문을 47억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스텔스 모드' 취하지만, 가끔 낭패도
이를 위해 운용사들은 '스텔스 모드(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비밀유지 상태)' 전략을 강조한다. 펀딩 자금을 조달하다가 소문이 나면 경쟁사들을 자극할 수 있고, M&A 영역에서 인수금융이나 자문 서비스 등을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는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입찰을 유도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비밀전략은 때로는 매도자 측이 원매자들끼리 경쟁시킬 때 지렛대로 이용될 위험도 있다. 또다른 PEF 운용사인 CVC캐피탈은 유명 신발 제조사 버켄스탁 인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계열의 L캐터튼의 기습 인수에 완패하고 말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공식 매각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투자회사들이 투자심사위원회를 더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수대상 자산을 미리 익혀두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이 성숙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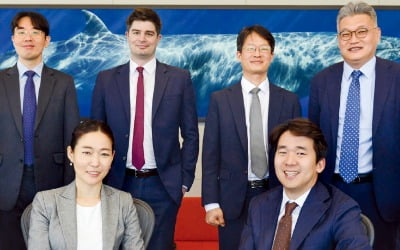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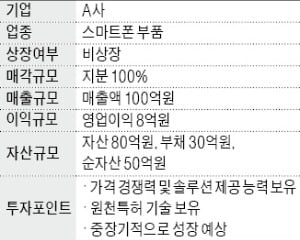
![[한경 CFO Inisight]PEF썰전-자본시장법 개정, PEF가 맞이할 변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071517.3.jpg)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