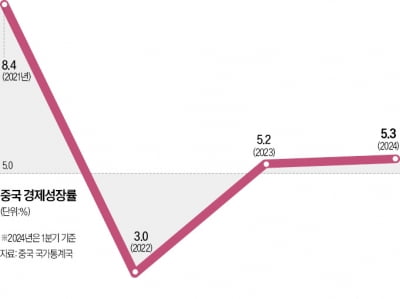스카이프 키즈가 일군 'IT 유니콘'…'에스토니아 마피아' 글로벌 누빈다
(1) 스카이프서 시작된 '스타트업 천국'
창업 동력 된 '스카이프 유산'
스카이프 매각대금이 '종잣돈'
자국 스타트업 투자로 이어져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끈끈한 네트워크로 연결
업계 70%가 스카이프 출신들 자원·기술 노하우 후배에 전수
스타트업 창업 선순환 이끌어

발트해를 끼고 있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유리사르와 같이 언제든 창업할 준비가 돼 있는 젊은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대학과 기업에 넘쳐난다. 스웨덴 핀란드 등 이웃 북유럽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의 벤처캐피털(VC)이 에스토니아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트해로 몰려드는 이유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에스토니아를 유럽에서 창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핫스팟’ 1위에 선정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매년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 문을 연다. 이 중 200여 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타트업이다. 시딩(seeding·초기 투자) 단계를 넘겨 정부의 관리를 받는 스타트업 수는 지난해 말 현재 413개. 인구 10만 명당 31개로 유럽 전체 평균 5개보다 6배 이상 많다. 영국(15개) 독일(8개) 프랑스(8개) 등 강대국들을 훌쩍 뛰어넘는다.
에스토니아가 25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운도 따랐기 때문이다. ‘100%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며 정부가 조성한 혁신의 토양 속에서 2003년 세계 최대 인터넷전화 업체 스카이프가 탄생했다. 에스토니아 창업가들은 “스카이프가 나온 건 에스토니아에 천운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스카이프가 남긴 유산
2003년 스카이프를 창업한 사람은 4명의 에스토니아 엔지니어와 스웨덴, 덴마크 사업가들이었다. 2년 뒤인 2005년 스카이프는 미국 이베이에 26억달러(약 3조원)에 팔렸다. 당시 에스토니아 국내총생산(GDP) 140억달러의 18%에 해당하는 부(富)가 유입됐다. 이는 고스란히 에스토니아 스타트업의 종잣돈이 됐다. 스카이프를 공동 창업한 4명의 엔지니어는 지분을 팔아 번 2억달러(약 2300억원)로 앰비언트사운드인베스트먼트(ASI)라는 투자회사를 세워 자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스카이프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남겼다. 이 회사에서 일하던 에스토니아 엔지니어들은 스카이프가 이베이에 이어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자 속속 자기 회사를 설립했다.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트랜스퍼와이즈가 대표적이다. 스카이프 창립 멤버인 타베트 힌리쿠스가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해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11억유로(약 1조2000억원)로 평가받았다. 힌리쿠스는 “스카이프를 통해 에스토니아인들은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는 노하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인 아티 헤일라와 야누스 프리스가 함께 창업한 스타십도 대표적인 ‘스카이프의 유산’으로 꼽힌다. 위성항법장치(GPS)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작은 로봇이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에스토니아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16개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독일 다임러그룹의 투자도 받았다.

농장관리 솔루션 업체 바이탈필즈를 창업한 뒤 지난해 미국 몬산토그룹에 매각한 마틴 랜드도 스카이프 출신이다. 그는 “트랜스퍼와이즈, 파이프드라이브(영업관리 솔루션 업체) 등 에스토니아 주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대부분 스카이프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들”이라며 “이 업계의 70%는 스카이프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에스토니아 스타트업계는 어느 공동체보다 끈끈함을 자랑한다. 스스로를 ‘에스토니아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다. 이 별칭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 데이브 맬쿨루어다. 2011년 영국 런던의 한 스타트업 멘토 프로그램에서 4개의 에스토니아 팀이 결선에 진출한 것을 보고 놀라 ‘에스토니아 마피아’라는 말을 썼다. 이후 에스토니아의 창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estonianmafia’라는 해시태그를 붙인다.
성공한 에스토니아 마피아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네트워크를 쌓고 이를 고국에 있는 후배 창업자에게 연결해준다. 일부는 탈린으로 돌아와 고국 스타트업에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기도 한다. 하이디 카코 에스토니아 엔젤투자협회 대표는 “에스토니아 마피아들은 실리콘밸리에 있건, 런던에 있건 네트워크와 자원, 기술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3256개
전자시민권(e-Residency)을 받은 외국인이 지난 2년6개월 동안 창업한 법인 수. 에스토니아에서 매년 신설되는 1만여 개 법인의 13%에 해당한다.
탈린·타르투=유창재/이동훈 기자 yoocoo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