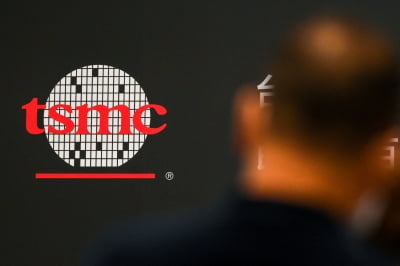[중국에 부는 식품韓流] 카페 같은 빵집·미술관 같은 피자집…먹거리에 고급문화를 얹어 팔다
뚜레쥬르, 빵 굽는 매장으로 히트
미스터피자, 조각 등 예술품 설치
CJ, 식당·영화관 한 건물에 배치
中 젊은이들 "특별한 곳에 온 듯"

![[중국에 부는 식품韓流] 카페 같은 빵집·미술관 같은 피자집…먹거리에 고급문화를 얹어 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310/AA.7963469.1.jpg)
카페 같은 빵집, 미술관 같은 피자집 등 프리미엄급 맛과 서비스를 내세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베이징 양광상둥점은 영화 ‘페이청우라오(非城勿擾)’ 촬영지로 등장하기도 했다. “상품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함께 파는 ‘한국형 모델’이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김명신 KOTRA 상하이 무역관 차장)는 것.
◆“빵 굽는 냄새가 참 좋아요”
“한국 빵집에 들어가면 맛있는 빵 냄새가 나서 좋아요”라고 왕린(35)은 말했다.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는 매장 안에서 빵을 굽는다. 항상 갓 구운 빵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매장에 가득하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배달된 빵에 익숙한 중국인이 강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음식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문화를 소비하러 오는 손님도 많다.”(박근태 CJ차이나 대표) 미스터피자의 상하이 5개 매장 안엔 다양한 모양의 조각과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시예칭(29)은 “식당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온 듯한 느낌”이라고 평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밝고 넓은 공간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젊은층이 자주 찾는다.
CJ는 아예 식당과 영화관을 패키지형으로 꾸몄다. CJ푸드빌의 식당 빕스와 비비고,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등과 영화관 CGV를 한 건물 혹은 옆 건물에 모아놓은 것. 황희철 파리바게뜨 중국법인장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고급 매장에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내 점포 수 82배 확장 목표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최근 중국에서 공격적인 매장 확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파리바게뜨(현재 125개)는 2015년까지 500개, 뚜레쥬르(현재 34개)는 2017년까지 1600개 점포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스터피자(현재 23개)도 5년 내 1000개 점포를 여는 게 목표다.
뚜레쥬르는 직영 원칙을 버리고 지난해 말부터 파트너에게 사업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했다. 파리바게뜨 역시 상하이에서 3개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100개점을 연 카페베네, 1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BQ도 본격적으로 매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출점할 것”(박 대표)이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물론 공격적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 롯데리아는 1994년 중국 진출 직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2003년 철수한 뒤 다시 출점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통음식점 놀부보쌈은 20억원가량 투자한 베이징의 대형 식당을 접고 짐을 싸야 했다. 황 법인장은 “한국이란 브랜드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급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상하이=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