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2.10.24 17:11
수정2006.04.02 23:09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1994년 멕시코,97년 한국,98년 러시아,2001년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위기가 나타나는 패턴이 비슷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머징마켓에서 고수익을 겨냥,수십억달러 상당의 주식 및 채권을 사거나 기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면 투자 자금을 여지없이 회수해 안전한 투자처로 옮겼다.
이 시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발표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국가들은 또 달러화나 다른 국가의 환율에 연동되는 외화표시단기채권을 계획성 없이 단기간내 너무 많이 발행한 공통점도 안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금융위기 국가들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대형 화재를 기다리는 부싯돌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금융위기 국가들의 자금조달 이유도 비슷했다.
이들 국가가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한 이유는 △학교 설립 △기업 보조금 △군대 운영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가개발비용이 거둬들인 세금보다 많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단기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외국의 은행들과 투자자들도 이들 국가를 금융위기로 몰아넣는 데 한 몫 했다.
투자자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상황이 양호할 때는 단기채권을 인수해주는 아량을 베풀다가도 상황이 악화되면 태도를 돌변,해당국 정부에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금융위기를 경험한 몇몇 나라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상실로 경제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반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지난 97년 말 한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당시 단기외화부채는 외환보유고의 3배에 달했다.
국가 파산상태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국은 이후 이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단기외화부채 비율을 외환보유고의 40% 수준으로 낮췄다.
반면 현재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회생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고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2백42%에 달하며 이미 디폴트 상태에 있다.
외채가 2천5백90억달러에 달하는 브라질은 좌익계열 노동당(PT)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후보가 27일 결선 투표에서 집권하게 되면 금리를 재조정,외채부담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조치가 일방적으로 취해진다면 브라질은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IMF의 케네스 로고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IMF가 각국이 계획성 있는 채권발행과 외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본의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경험은 각국 정부가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Financial-Crisis Pattern Offers Lessons to Developing Nations'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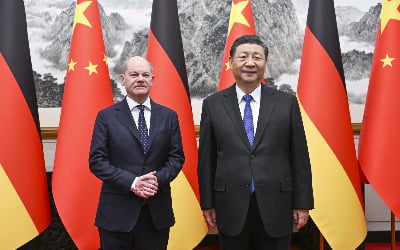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