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덴버회담 이후...환율의 향방은'
G7(선진 7개국)모임에 러시아가 처음 참석한 회담이란 점에서 정치적인
성과는 적지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쪽에서도 ''득실'' 판단이 힘들다.
회담결과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앞으로의 환율추이.
문제를 푸는 방정식은 미국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압력을 가할 것인가였다.
강도가 셀수록 달러약세(엔고), 약할수록 달러강세(엔저)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등식이다.
결론은 싱겁게 끝났다.
공동성명에선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묘수가 제시되지 못했다.
환율문제도 추상적인 언급만 있었다.
지난 4월 G7재무장관회담 때의 모호한 ''선언''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
환율 움직임이 각국의 무역균형을 해쳐서는 곤란하다는 정도다.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엔.달러환율은 당분간 지금과 비슷한 추이로
움직일 전망이다.
달러당 1백10~1백15엔선의 달러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계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급격한 엔고는 없을 것이란 얘기이기도
하다.
실제 정상회담이 시작된 20일 뉴욕시장의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백14.92
엔으로 회담직전(1백14.00엔)보다 소폭 올랐다.
회담이 끝난 23일 처음 열린 도쿄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1백14.58엔)보다
오른 1백15엔대에서 거래됐다.
뉴욕 하이-프리퀀시경제연구소의 칼 와인버그박사는 "지난 4월 G7재무장관
회담의 결과는 달러화가 1백10~1백15엔선에서 움직일 것이란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도 이런 추이를 바꿔놓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한 엔고가 없을 것이란 배경은 "G7정상들은 달러가 무역분쟁을 해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일본
대장성 고위관계자의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으로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EU단일통화문제가 불거져 있는 등 환율안정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기인 탓이다.
최강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의 자신감도 대일본 공세를 거세게 몰아붙이지
못한 요인중 하나로 해석된다.
미국은 "앞으로 2년내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1천3백억달러
선으로 급증할 것"(클린턴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가급적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때까지 ''마지막 수단''은 아껴두겠다"(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 대표)는 생각이다.
일본이 당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정도
이해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대미무역흑자를 줄이는 공은 일단 일본측으로 넘어갔다.
G7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내수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엄청난
대외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원론만 되풀이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도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적절한 금융개혁'' 등 늘상
하는 얘기만 다시한번 강조했다.
일본은 지금 하시모토총리가 직접 나서 6개분야에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과감한 금융개혁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규제완화와 금융개혁의 긍정적 효과가 언제 가시화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관리들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뿐이다.
일본의 자체노력이 미흡할 경우 G7은 언제라도 이 문제에 다시 달려들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국제환율안정기능의 수행을 강조하면서 환율문제에 대한
재무장관들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말이다.
< 육동인 기자 >
[[ 덴버회담 경제공동성명 요지 ]]
- 인플레 억제, 저축 증대(미) 사회보장 확대 등 구조 개혁(유럽)
내수주도 성장으로 무역흑자 억제(일)
- 투자환경과 세제의 근본적 개혁(러)
- 외환시장에서의 긴밀한 협조
- 개도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방안 강구
- 고령화사회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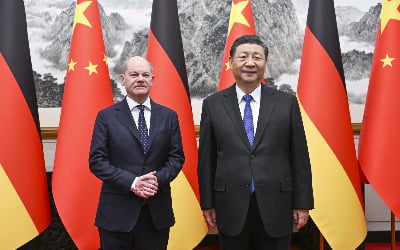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