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시장 "'구즈범프'를 잡아라" .. 캐릭터사업/영화화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시체 먹는 귀신 "구즈범프" 이야기.
미국 스콜레틱사가 펴낸 이 동화책 시리즈는 한달에 무려 4백만부 이상
팔리는 초베스트셀러다.
이런 열기는 캐릭터 사업으로 번지면서 "구즈범프 신드롬"까지 낳았다.
장난감, 셔츠, 공책, 가방등 아동용품에 구즈범프 딱지만 붙이면 날개
돋친 듯 팔릴 정도다.
최근에는 구즈범프가 안방의 TV화면속을 누비고 있다.
구즈범프영화도 개봉박두다.
구즈범프 신드롬은 미국 국경을 넘어 중국과 체코등 개발도상국까지
전세계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구즈범프 관련사업은 아동시장에서 "대히트"라는 1억달러 고지를 넘은지
오래다.
이런 스피드라면 10억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구즈범프가 첫 출간되던 지난 92년에는 별 인기를 못끌었다.
구즈범프 디자인도 그저 그런데다 동화 내용도 신통치 않았다.
시리즈 책별로 일관성도 없었다.
그러니 판매성적이 좋을리 없었다.
캐릭터 사업이나 영화화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런 진부한 귀신얘기가 아동시장의 유래없는 빅히트작으로 변신한 비결은
어딨을까.
바로 "마케팅"이었다.
구즈범프 신드롬을 창조한 마케팅 제1조는 "유머"였다.
판매부진에 고심하던 저자 R.L.스타인은 공포에 유머를 가미해 구즈범프를
"웃기는 유령얘기"로 새단장했다.
얘기가 재밌어도 실제 돈이 있는 부모가 책을 사주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부모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스콜레틱사가 생각해낸 마케팅 제2조가 "독서
교육"이었다.
"책을 읽히자"는 슬로건은 TV와 비디오에만 매달리는 애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의 심리에 적중했다.
"지나친 공포얘기는 아이들의 정서를 해친다"며 구즈범프 동화책 사주기를
꺼려하던 부모들마져 이런 마케팅 전략앞에서는 맥을 못췄다.
"작가 띄우기"가 구즈범프 마케팅의 제3조.
때마침(94년) 이 동화의 작가 스타인이 최고인기작가 존 그레샴까지 제치고
미국의 대중지 US투데이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로 뽑혔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아동용품업자, TV연출가, 영화제작사까지 스타인에게
스폿라이트를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구즈범프 얼굴을 제품이 새기겠다는 아동용품업자,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자는 TV및 영화관계자들의 제의가 폭주했다.
드디어 지난해 11월 미국 영화제작사 폭스사가 구즈범프를 어린이용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
방영 즉시 어린이 프로그램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구즈범프 얼굴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상품들도 쏟아졌다.
펩시콜라, 타코벨, 허쉬등 식음료업체들은 지난달 31일 할로윈 축제때
3천만달러의 구즈범프 상품 판촉을 벌였을 정도다.
구즈범프의 인기는 지금 절정에 달했다.
내년 TV방영분 예약까지 끝난 상태다.
구즈범프를 이용한 3개 프로그램이 내년 5월 미국 TV들의 황금시간대
방영을 위해 제작중이다.
그러나 구즈범프 마케팅의 백미는 "절제"다.
스콜레틱사는 구즈범프가 반짝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미래관리"까지
철저하다.
스콜레틱사는 현재 구즈범프 캐릭터의 사용을 40여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금 장사가 잘된다고구즈범프 캐릭터를 남발하다간 소비자들이 쉽게
식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세이하 유아용품에는 아예 캐릭터 사용을 자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아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공격을 사전제압하기 위한 전략이다.
스콜레틱사는 현재의 구즈범프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영화나 이벤트
사업들을 매달 새로 짜고 있다.
업계에서 구즈범프 신드롬의 롱런을 점치는 것도 이런 치밀한 마케팅
때문이다.
< 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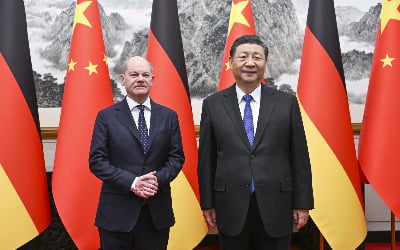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