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동차 '리콜카'로 전락..4월이후 국내서만 200만대넘어
자동차가 "리콜카"로 타락하고 있다.
일본 최대자동차 업체인 미쓰비시자동차는 18일 브레이크 호스의 결함으로
일본과 해외에서 총 63만3천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90년 4월-94년 2월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된 시그마, 디아만테,
데본에어, GTO, 파제로등 5개 모델과 92년 11월에서 95년 5월 사이에 호주
자회사에서 생산된 디아만테 웬곤등 총 6종.
이로써 올 회계연도(96년 4월-97년 3월)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의 리콜대수
는 해외에서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도 무려 2백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회계연도(5만3천대), 94회계연도(1백72만대) 기록을 불과 3개월여만에
앞질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건수기준으로는 불과 6건.
지난 회계연도의 10건이나 94회계연도의 14건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다.
결국 리콜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부품공통화"를 이같은 "리콜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수퍼엔고와 미.일 자동차 분쟁등 이중고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원가절감에 돌입했었다.
그 최대 전략이 부품 공통화였다.
모델별로 제각각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표준을 2-3개로 줄여 한가지 부품
으로 여러 모델에 쓸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A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면 그 부품을 쓰는 모델의
자동차만 리콜했지만 이제는 대여섯가지 모델의 자동차를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닛산자동차가 대표적인 예.
닛산은 지난 5월 뱃터리선 결함으로 1백만대규모의 사상 최대 리콜을 단행
했다.
지난 88년-92년 사이에 팔린 전체 닛산자동차 모델중 절반 이상이 이
뱃터리선을 장착하고 있었다.
닛산측도 "리콜의 대형화는 부품공통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없이 무조건 원가절감을 추진했던 것도 일본자동차
리콜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원가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데만 골몰하는 사이에 부품의 질이나
검사시스템은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부품마다 철저한 시방서를 요구했던 철저한 품질관리
관행은 뒤로 밀쳐둔채 원가절감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원가절감 노력이 "리콜비용"로 변해
일본 자동차 업체의 짐으로 되돌아온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리콜비용이 일본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무려 1백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한 닛산이 경우 비용은 60억엔(약 6천만
달러).
이달초 리콜을 실시한 도요타는 25만7천대를 수거해서 고치는데 45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대개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가공동 부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계에 직접적인 짐이
되지는 않는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리콜의 최대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다.
리콜은 제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마련이고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일본 자동차의 명성이 리콜 사태로 쉽사리 날라가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리콜서비스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딜러들이 모처럼 구매객들과 얼굴을 맞대고 친절한 서비스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리콜이기 때문이다.
이때 잠재적인 차기구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눌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엔저" 순풍속에서 쾌속항진하던 일본 자동차업계가 "리콜"이라는 암초를
어떻게 비켜 갈지가 일본 자동차의 세계시장 탈환에 주요변수가 된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 경제 성장 문제 없다" 재무장관 발언에…상승 마감한 유가 [오늘의 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571885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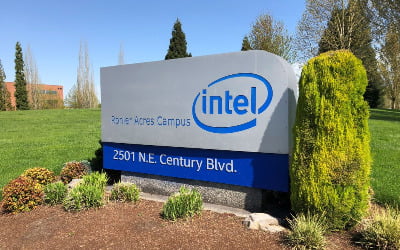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체코 국민작가 보후밀 흐라발 단편집 '이야기꾼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26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