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기업] 미국 하니웰사..생산코스트 절감 실패 '허덕'
했다.
회사 매출은 지난 5년간 60억달러 안팎을 맴도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순익은 80년대말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수 합병에 관한
소문이 꼬리를 무는 등 위기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하니웰은 센서를 비롯 가정용 주택이나 사무용 빌딩의 환기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주는 컨트롤러, 산업용 자동화기기, 항공기 조종석등에 필수적인
첨단 전자기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상당수 보유, 업계를 끌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이회사는 지난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진에서 쉽게 벗어
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몇년간은 집중적인 리엔지니어링 처방에도 불구, 수지가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되기만 해 경영진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예를들어 이회사의 3대 주력부문의 하나로 지난 91년까지만해도 외형이
21억3천만달러에 달하던 항공.우주분야 매출은 지난해에는 14억3천만달러
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해에는 고용감축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체질을 강화했으나 매출증가
는 1.7%에 그쳤으며 순익은 13%나 감소, 2억8천만달러를 밑돌았다.
하니웰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궤를 같이 한다.
항공산업 불황에 따른 보잉사등의 부진은 하니웰의 항공.우주부문 사업
위축으로 연결됐으며 미국내 건설경기침체는 빌딩및 주택용 컨트롤러사업에
크나큰 타격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이회사의 부진이 경기탓 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니웰은 생산코스트를 낮추는데 실패, 순익감소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비록 하니웰이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5억달러를 들여 근로자를 5만1천명
으로 28% 줄이고 생산설비를 감축시키긴 했지만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4년동안 하니웰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은 한해 평균 16%씩 올라갔으나
1인당 운영수익은 6%대로 떨어졌다.
또 회사의 영업및 일반관리비용등은 지난 87년 18.2%에서 지난해에 1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니웰의 경영정책은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주주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로 인해 하니웰의 경영진들은 더욱 궁지에 몰렸으며 올해가 진퇴를
가름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니웰의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은 그러나 이런 난국을 타개할
자신감이 있는 듯하다.
유럽지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에서 빌딩및 주택부문의
대체수요가 크게 일어 이분야사업은 두자리 숫자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용 컨트롤러분야도 극동지역에서의 주문이 늘기 시작, 큰 폭의 신장이
예상되며 항공.우주부문에서도 불경기가 끝나는 조짐이 엿보인다는 것이
하니웰 경영진들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하니웰이 현경영진의 바람대로 경쟁력이 살아나고 독립적인
노선을 걸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매수 합병의 손길이 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리톤사와 연관된 12억달러상당의 특허침해 배상재판이 이에 대한
억제 역할을 했으나 지난달 초 한 LA지방법원 판사가 결정적으로 하니웰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바람막이가 없어져 제너럴일렉트릭등의 매수 합병
움직임이 활기를 띨 예상이다.
하지만 퇴진압력을 무릅쓰고 가능한 한 고용감축을 자제하는등 인간적인
경영을 해온 본시그노사장에 대한 하니웰 임직원의 신임은 두터우며 그를
중심으로 온회사가 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 김현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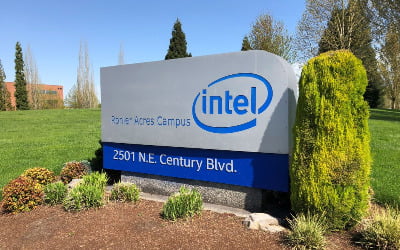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