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에 꽂힌 증권사…전담 애널리스트 채용 '바람'
KB증권도 외부인력 충원
IPO 주관사 업무 확보 포석
자기자본 투자 기회도 확보
24일 NH투자증권은 첫 비상장기업 분석 리포트 ‘비상장회담, N잡러의 시대’를 발간했다. 크몽, 숨고, 위시캣 등 인력 매칭 플랫폼기업을 다룬 자료다. NH투자증권에서는 최근 벤처캐피털(VC) 출신의 오세범 애널리스트를 영입하는 등 4명의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비상장기업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
KB증권도 지난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비상장회사 전담 조직을 꾸렸다. 기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PI와 VC 경험이 있는 외부인력을 충원했다. DB금융투자도 현재 3명의 비상장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각 산업 전담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섹터 내 비상장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내고 있다.
비상장기업은 직접적으로는 IPO 주관사를 맡는 데 도움이 된다. IPO를 앞둔 기업들은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주관사를 선정한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은 IPO 경험 및 마케팅·IR 전략을 발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나관준 전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까지 바이오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올해는 주식발행시장(ECM) 부서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증권사의 PI 투자를 위한 의도도 있다. 유니콘 기업 등 굵직한 IPO는 대형 증권사가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가 이 시장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자본 규모가 크다 보니 자기자본 투자에도 관심이 많다”며 “비상장 애널리스트는 기관투자가 세미나 등 업무가 많은 기존 애널리스트와 달리 내부 투자심의보고서 작성 등 VC 업무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최근 전문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비상장기업 투자를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 역시 비상장기업 투자에 관심이 많다. 시장의 관심에 힘입어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2020년 말 시가총액이 17조원에서 10개월 만에 거의 배로 불어난 셈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계속해서 비상장기업 분석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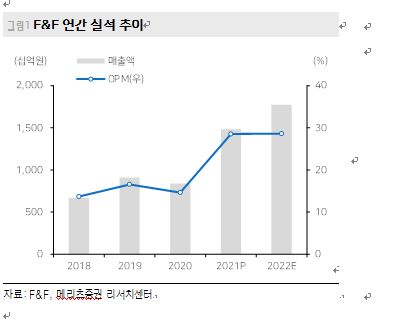


![돌아온 에코프로…HLB 밀어내고 코스닥 시총 2위 탈환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33339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