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박스피' 장세…ELS 매력 다시 각광
지수 하락시 매수 땐 수익 안정
'KB able ELS' 年 6.5% 수익률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ELS 발행금액은 56조5782억원이었다. 올 1년치 발행액은 지난해(67조5255억원) 수준에 못 미칠 전망이다. ELS 발행금액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99조9408억원에 달했다. 2016년(47조2463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등을 거치며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 탓이다.
ELS는 삼성전자, 테슬라처럼 특정 종목이나 S&P500, 코스피200 같은 특정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2~3개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50%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KB증권이 청약 중인 ‘KB able ELS 제2067호’는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홍콩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연 수익률은 6.5%, 만기는 3년이다.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3개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계약 당시의 90%를 넘으면 연 6.5%의 절반인 3.25%의 수익률을 기록한 뒤 상환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온다. 상환 기회 때마다 기초자산의 상환 조건 가격이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36개월차엔 70%를 넘으면 된다. 70%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3개 자산 모두 계약 당시보다 50% 이상 떨어진 적이 없다면 총 연 6.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최대 3년간 19.5%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청약 중인 ELS 상품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키움증권의 ‘제262회뉴글로벌100조’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3개월마다 상환 시기가 찾아온다. 만기는 1년이다. 1년 내 두 종목이 계약 당시보다 50% 넘게 떨어지지 않으면 연 최대 25.1%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년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LS의 매력이 커지는 이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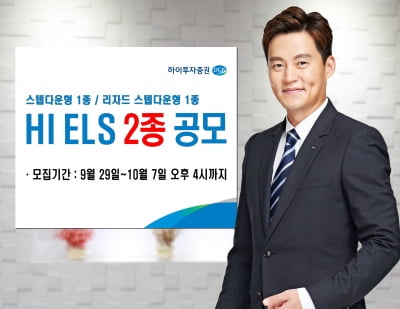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