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아 외면 받는 공모펀드…정부 "성과보수펀드 활성화할 것"
업계 "편입주 '10%룰' 규제 풀고
장기투자 땐 세제혜택 줘야"

공모펀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형펀드 수탁액은 2010년 96조7000억원에서 작년 45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53.2% 쪼그라들었다. 공모펀드 내 개인투자자 잔액 비중은 2015년만 해도 51%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41.5%까지 감소했다.
금융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 수차례 공모펀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못 미치면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보수가 깎이는 성과연동형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외면받는 건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재탕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당국은 2017년 성과보수펀드를 도입했지만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 14개 펀드에서 225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운용업계에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깨알 규제’가 수익률 제고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펀드 내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한 ‘10%룰’이다. 삼성전자의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이 28%가 넘는 상황에서 10%룰을 고집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모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장기 투자에 대한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보니 글로벌 대비 평균 펀드 투자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다”며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에 따른 손실에 완충 작용을 해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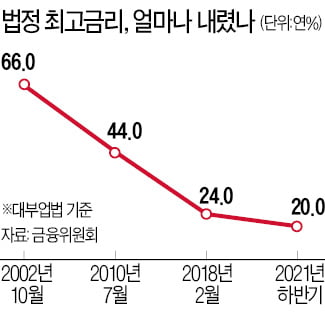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