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포렌식 팀이 있다?…4대 법인 관련인력 150명 달해
외감법에 외부전문가 고용 규정
사모펀드 등 이슈로 수요 늘어
포렌식 관련 전문가들의 존재는 오래됐지만 국내에서 기업의 부정 등을 밝혀내기 위해 포렌식 조직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다. 회계법인 중에서는 2002년 관련 팀을 신설한 삼정KPMG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포렌식팀에 약 30명,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인원을 포함 50명 규모의 팀을 두고 있다. 삼일PwC 등 4대 회계법인의 포렌식 담당자를 모두 합하면 150명에 이른다. 법조계에서 포렌식팀을 크게 꾸리고 있는 김앤장과 태평양을 포함하면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들 포렌식팀의 역할은 무엇일까.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할 권리도 없는데 누가 이들에게 기업의 내밀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일까.
이들의 활동 근거를 살펴보면 답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3항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특히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을 고용한다는 뜻이다. 감사는 이 결과를 외부 감사인(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의적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라고 규정한 게 외감법 제22조의 취지다. 포렌식팀이 직접 고용되는 경우 외에도 수요는 많다. 기업의 감사인으로 고용된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포렌식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고정우 삼정KPMG 전무는 “회사 관점에서 보면 검찰에 자료를 주는 것과 회계법인 포렌식 조직에 자료를 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검찰은 범법 행위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회계법인 등은 회사가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찾도록 돕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에 문제가 생긴 회사나 경영진이 교체된 회사에서는 포렌식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이슈 때문에 포렌식팀의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맡고 있는 삼일PwC회계법인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팀을 실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는 회계법인은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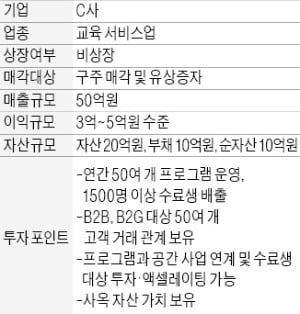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