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집단소송의 길' 4년 만에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동양 사태는 2013년 10월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수만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동양그룹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회사채를 발행했다.
서씨 등 1254명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이 빠져 있거나 허위로 기재됐고, 회사 측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회사채 매수 모집사무를 주관한 옛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을 상대로 2014년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송을 불허했다. 1심은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유안타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은 소송의 대표당사자 5명 중 2명이 해당 회사채를 취득·보유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며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 결정은 하급심에서 구속력을 가진다”며 “절차상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소송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면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효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원이 정한 ‘분배관리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권리 신고를 하고 분배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소송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대표당사자 요건을 완화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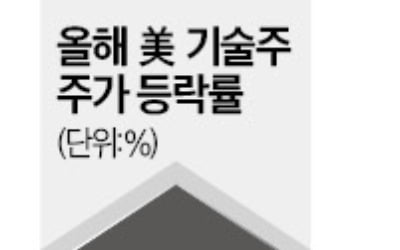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