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제재 받은 기업 89곳… 6년 만에 최대
"회계개혁 통해 신뢰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전체 감리 기업에서 분식회계 적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1%에서 매년 등락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66%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이 감리 대상을 확대하면 회계처리를 위반한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되지 않고 숨어있는 분식회계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상장사를 감리하는 평균 주기는 기업 한 곳당 약 25년(2016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감리 주기 3~10년에 비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내년 이후 감리 주기를 10년 정도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표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한 ‘2017년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2016년 조사에서도 61개 대상 국가 가운데 61위였다.
전문가들은 회계개혁안 시행과 맞물려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계개혁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안은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보호해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라며 “한국 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회계정보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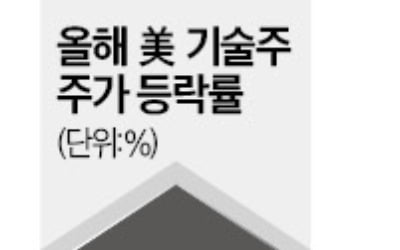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