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뜨고 '용과장' 짐싸고…삼성전자 랠리가 바꿔놓은 펀드매니저 세계
성장성 좋은 중소형주 투자
최근 장세서 두각 못내
"차라리 창업이나 하자"
연봉 제자리…30대 이직 속출
업계 관료화에도 '염증' 느껴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펀드’의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30대 대표 펀드매니저로 떠올랐던 박택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섹터리서치본부 팀장이 최근 회사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매니저는 조만간 개인 투자회사를 차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2007년부터 일했던 공채 1기 홍진채 펀드매니저도 지난 5월 퇴사했다.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의 부책임 운용역 등을 맡았던 홍 매니저는 헤지펀드운용사 ‘라쿤’을 설립했다. 동양자산운용의 간판 펀드인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을 운용한 김용환 팀장도 공모펀드 업계를 떠났다.
2014년 말~2015년 상반기 30대의 젊은 매니저들은 삼성전자 등 전통 대형주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주목했다. 4~5배 오른 바이오·헬스케어주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과감히 담아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이들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용감하게 담는다는 의미에서 ‘용과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올 들어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형 운용사의 한 30대 펀드매니저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데 큰 노력을 쏟지 않는 40~50대 펀드매니저들이 인정받는 세태가 생겨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펀드매니저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젊은 펀드매니저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체 펀드매니저 수는 2014년 12월 610명에서 580명으로 30명(4.9%) 줄었다.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 펀드매니저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 이유다. 올해 대형 자산운용사를 다니다 최근 개인 투자회사를 차린 한 펀드매니저는 “개인 회사를 설립한 동료들이 지난해 상반기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창업을 결심했다”며 “낮은 연봉에 성과 배분도 잘 안 되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젊은 펀드매니저에 대한 대우도 박해지고 있다. 현재 연봉 수준은 펀드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중반보다 낮은 것은 물론 연차가 쌓인 40~50대 펀드매니저 연봉의 30~50%에 머물고 있다는 전언이다. 30대 초반의 한 펀드매니저는 “1980년대생 펀드매니저들이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 의기투합해 소규모 투자사인 ‘부티크’를 차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2000년대엔 능력만 있으면 대형 펀드를 맡아 30대에 스타 펀드매니저가 될 기회가 있었던 펀드 업계가 최근엔 일반 기업처럼 관료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펀드매니저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회사 간 이직이 많고 연봉도 업무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한 자산운용사의 30대 펀드매니저는 “부장급 매니저들이 주도해 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젊은 직원에서 스타급 펀드매니저가 새로 나오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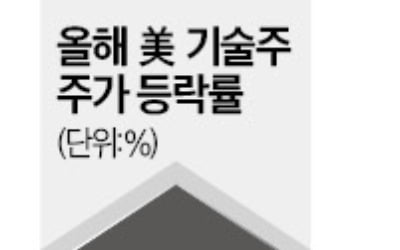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