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판이 흔들린다] '고정수수료 폐지'로 위기 맞았던 미국, M&A 자문·해외진출로 돌파
1990년대 일본 증권사
비상장사 주식 매매 차별화
미국 증권업계는 1975년 위탁매매수수료 자율화로 격랑에 휩싸였다. 180년간 유지된 고정 위탁매매수수료 제도라는 ‘병풍’이 사라지자 증권사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이후 오일쇼크 등에 따른 증시 침체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증권업계 판이 흔들린다] '고정수수료 폐지'로 위기 맞았던 미국, M&A 자문·해외진출로 돌파](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AA.12119430.1.jpg)
1990년대 일본 증권업계는 요즘 한국 증권업계를 복사해 놓다시피 한 모습이었다. 일본은 1998년 증권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증권사 진입 규제가 완화됐다. 1999년에는 수수료가 완전 자율화됐다. ‘거품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에 증시 침체가 겹치면서 일본 증권업계는 상시 위기체제를 맞았다. 저금리와 저성장, 인구 고령화의 ‘3대 악재’도 일본 증권사들을 괴롭혔다. 1990년 227개에 이르던 일본 증권사 중 147개사가 1990년대 말 도산했다.
온라인 전문 증권사,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와 같은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 증권사가 다수 등장하면서 업계 지형도도 많이 바뀌었다. 기관영업과 선물거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도 나왔다. 대형사는 위탁매매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자산관리형 사업모델로 빠르게 전환했다. 일본 증권업계는 노무라 다이와 같은 대형 증권사, 온라인 증권사, 은행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 재편됐다. 중국주식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도요증권과 비상장주식 매매에 특화한 디브레인증권, 엔젤증권, 미래증권 등 특화사업 전문 증권사도 늘어났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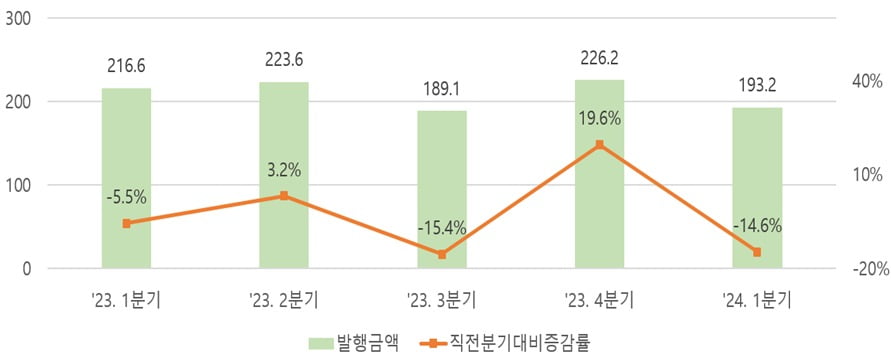

![한미반도체, 1분기 영업익 287억…전년비 1283.5%↑ [주목 e공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81.3.pn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노인들은 아무리 말려도 왜 운전대를 놓지 않을까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675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