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판이 흔들린다] 불붙은 '초대형 IB 전쟁'…메리츠·한국투자증권 "M&A 막차 타자"
정부 '3-4-8조' 가이드라인
증권사 덩치 경쟁 거세질듯
하이투자 몸값 오를까 주목
SK증권도 매물로 나올수도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2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10조원 증권사가 목표인 만큼 8조원 기준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증권 인수로 자기자본을 6조7000억원까지 늘린 미래에셋대우의 여유가 묻어났다. 이와 달리 3조~4조원 문턱에 선 증권사들은 몸집을 더 키우는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4조원대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곳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두 곳이나 있어 대형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형화 경쟁’이 불붙은 한국 증권업계의 현장 모습이다.
![[증권업계 판이 흔들린다] 불붙은 '초대형 IB 전쟁'…메리츠·한국투자증권 "M&A 막차 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01.12113470.1.jpg)
당장 마음이 급한 곳은 자기자본 3조원대인 삼성증권(3조4000억원)과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원)이다. 당장 인수합병(M&A)할 만큼 매력적인 매물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인수에 잇따라 실패한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창’ 전략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자로 대형화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다른 증권사를 인수해 대형화 경쟁의 중심에 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M&A 경쟁의 막차를 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증권은 “일단 IB와 리테일을 융합한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수익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형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형사 중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이 회사는 2014년 말만 해도 자기자본이 7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유상증자와 IMM투자증권 인수로 1조7000억원까지 덩치를 불렸다. 이 회사의 김수광 경영기획본부장은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을 늘려 갈 것”이라며 “매력 있는 추가 M&A 매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계열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1조8000억원)의 행보도 관심이다.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단숨에 3조원 대형사로 올라선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지주사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임원은 “증자가 절실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지주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레버리지(부채)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전략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추가 M&A 매물은 어디?
국내 증권업계의 대형화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증권사 몸집이 커져야 위험자본으로서 증권사 본연의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생존 경쟁의 중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IB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면 든든한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 인수 가능한 매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하이투자증권에 투입한 돈은 1조원이 넘지만 매각가는 5000억원 내외로 거론돼 왔다. 인수 이후 시너지 등을 감안하면 대우증권이나 현대증권 같은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초대형 IB 기준이 새롭게 정해지면서 흥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기업 증권 계열사 중에서는 SK증권 매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SK C&C와의 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SK는 내년 8월까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 때문이다.
윤정현/최만수 기자 hi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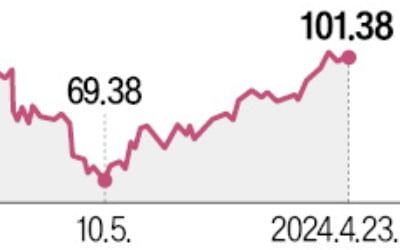












![[이 아침의 음악인] 말코 지휘자 콩쿠르, 韓 최초 우승자 이승원](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126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