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의 비상장사] 공공기관서 퇴출된 '급식대장' 아워홈…식식(食食)하게 제2 도약 준비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 배제에 업계 1위서 3위로 밀려
86세 구자학 회장, 매일 출근…"2020년 매출 2조5000억 목표"
푸드코트 시장 공략 본격화…가정간편식 개발도 집중
![[베일속의 비상장사] 공공기관서 퇴출된 '급식대장' 아워홈…식식(食食)하게 제2 도약 준비](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73672.1.jpg)
요즘 이 기업은 재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 매출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1년까지 국내 1위를 달리던 매출은 2012년부터 삼성웰스토리(2013년 옛 삼성에버랜드에서 분사)와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계열)에 뒤처졌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워홈은 2000년 옛 LG유통의 푸드서비스(FS) 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이끌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구 회장의 조카다.
아워홈 사업부는 급식(푸드서비스), 식자재, 식품(가정 간편식), 외식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단연 급식이다.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워홈의 급식 점포 수는 작년 말 기준 약 900개로 하루 평균 전국에서 100만식(食)을 제공하고 있다. 점포 수 기준으로는 경쟁사인 삼성웰스토리(800여개), 현대그린푸드(500여개) 등을 앞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아워홈은 2000년대 중후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4년 5000억원대였던 매출은 5년 만인 2009년에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급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급식 및 식자재 사업부를 운영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LG 관계사 점포비중이 2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장 포트폴리오도 뛰어났다.
조금씩 벌어지는 격차
성장을 지속하던 아워홈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2012년.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은 공공기관 급식사업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권고하면서부터다. 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아워홈은 당시 LG그룹 계열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범(汎)LG 계열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주요 공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던 아워홈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13년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그린푸드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동안에 아워홈은 오히려 3%의 감소세를 기록한 이유다.
한번 뒤집힌 판세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급식 3사 매출은 △삼성웰스토리 1조6623억원 △현대그린푸드 1조4760억원 △아워홈 1조3438억원이었다.
어떻게 만회할까
구자학 회장은 86세라는 고령에도 여전히 매일 출근해 권토중래를 다짐하고 있다. 아워홈은 올해 초 구 회장의 지시하에 2020년 ‘매출 2조5000억원’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조규철 홍보팀장은 “급식 사업부에서는 푸드코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식자재 및 식품 사업부는 각각 프랜차이즈 업체제휴와 가정간편식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식 사업부에서도 푸드엠파이어 싱카이 키사라 등의 브랜드 매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구 회장의 막내딸로 경영 일선을 챙기던 구지은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고 그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성 부회장이 새로운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구 전 부사장은 자신이 최대주주(46%)로 있는 관계사 캘리스코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1957년생인 구 부회장은 LG전자 미주법인, 삼성물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임원도 지냈다.
이번 인사를 놓고 후계구도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회사 측은 “구 회장이 정정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논의”라고 일축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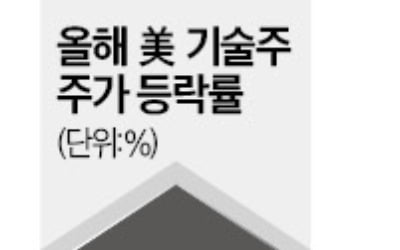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