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플러스] 국내 운용사 '우물 안 개구리'…미래에셋만 예외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가운데 미래에셋을 제외하고는 해외 진출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운용사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고객(투자자)의 운용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을 뿐 해외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내 운용사는 12개다.
이중 미래에셋이 가장 많은 12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에셋플러스도 4개 법인을 두고 있다.
삼성과 한화, 한국 등 나머지 운용사들은 현지 법인 1개만을 가지고 있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무소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계 12개국에 나가 있지만 미래에셋과 에셋플러스, 에프지를 제외한 나머지 운용사들은 모두 아시아 지역에만 진출해 있다.
미래에셋은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12개국에 11개 법인과 2개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자본연이 미래에셋을 포함한 4개 주요 운용사의 해외 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1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4억300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늘어난 운용 자산의 대부분이 미래에셋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3개 회사의 해외 법인 운용 자산 규모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4개 회사의 해외 법인 전체 운용 자산 중 약 93%가 미래에셋 운용 자산이다.
미래에셋은 2006년만 해도 해외 법인 운용 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2010년 5억3000만 달러로 늘었고 2012년에는 55억3800만 달러, 지난해에는 98억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4개 회사의 해외 법인 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고객 자산은 9억5200만 달러, 해외 고객 자산은 96억4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해외 고객 자산 중 96억3600만 달러는 모두 미래에셋이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의 해외 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해외 고객 자산은 1000만~3000만 달러 내외로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김재칠 자본연 선임 연구위원(실장)은 "미래에셋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경우 사실상 국내 고객의 운용 자산을 본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데 불과하다"며 "미래에셋을 뺀 나머지는 해외 수요 창출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운용사들의 편향적인 영업 구조는 해외 운용사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운용사인 블랙록과 프랭클린 등은 전체 운용 자산 규모에서 해외 고객의 자산 비중이 각각 38.4%와 27%에 이른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셋도 해외 고객 비중이 42%에 달한다.
자본연은 국내 운용사가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는 것은 필요성과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영업만으로도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어서 위험성 높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요 운용사의 대주주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그룹인 만큼 해외 시장 진출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자본연의 분석이다. 대주주로부터 안정적인 일임계약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장기 성장에 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삼성운용의 대주주는 지분 96.3%를 가진 삼성생명이고 한화와 KB, 한국운용은 각각 한화생명(100%), KB금융지주(100%), 한국증권(100%)이 대주주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에 이름이 알려져있지 않은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진출에 높은 위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내 고객의 해외 투자를 위해서도, 해외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외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려는 소위 '기업가 정신'을 가질 때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또 대주주 증자, 상장 등을 통한 충분한 자본력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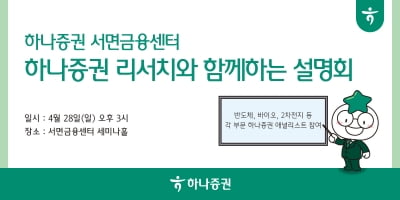
![[AI 종목 진단]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에 정식 납품"…테크윙 7% 상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9706.3.jpg)



!["14억이 전기차 타야하는데"…인도, 리튬·니켈 확보전 뛰어든다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06152.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