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36
수정2006.04.03 14:39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上場)'이 올해 안에 실현될 것인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생보사 상장 논쟁'이 다시 금융가의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이 "상장기준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는 CJ와 신세계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벌써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내부유보금 처리가 관건
생보사 상장은 1989년 이후 교보ㆍ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처음 쟁점화됐다.
90년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1차 유보됐고,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출연하면서 주식 현금화를 위해 다시 논의됐지만 상장 차익배분 문제에 걸려 마무리되지 못했다.
삼성과 교보생명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이들 회사 재무제표에 계약자 몫으로 쌓여있는 내부유보금(자본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교보와 삼성생명은 지난 89년과 90년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재평가 차익(교보 2천1백97억원, 삼성 2천9백27억원)을 주주(29.9%)와 계약자(40%)에게 분배하면서 계약자 배당 재원 및 결손 보전금으로 쓰려고 일부(30.1%)를 자본계정에 남겼다.
삼성생명 8백78억원, 교보생명 6백64억원이다.
최근 삼성 등이 다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뒤 주식을 무상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측은 이 돈이 애초부터 자본 성격이 아닌 만큼 자본금 전입이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로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 30.2%, 교보생명은 24.7%의 지분을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상장 논의 때는 시민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지금은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자본금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시민단체와 생보사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 입장도 왔다갔다 하는 형국이다.
◆ 유연해진 금융당국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기존 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부유보금의 자본 전입과 무상 주식 배분이 어려운 만큼 주식배분에 근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나누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99년보다 후퇴한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생보사측도 주식배분과 비슷한 부담을 초래하는 '현금 배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금감위원장도 이 때문에 "상장 기준을 8월까지 만들어볼 생각"이라면서도 "(상장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회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기준 마련=삼성생명 상장'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공'은 삼성ㆍ교보생명에?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은 최근 "연내 상장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해당 기준은 물론 증시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기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증시 상황이 나쁠 경우 상장을 미루겠다는 얘기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상장기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렇더라도 충분히 준비한 뒤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두를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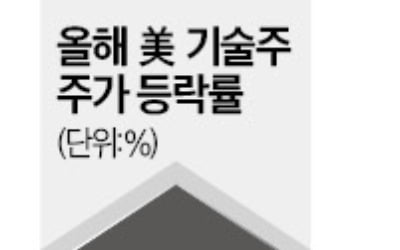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美 인물화 거장의 붓질을 바꾼 건…'두 번의 로마의 휴일'이었다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003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