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15
수정2006.04.02 20:17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1987년 첫 도입된 이래 10차례나 개정됐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인정,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등 기업들에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출자를 본격 옥죄기 시작한 것은 지난 94년말 4차 개정때부터였다.
그 이전까지 40%로 돼 있던 순자산(자본총액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제외한 금액)대비 출자총액한도 비율을 25%로 강화한 것.기업이 사업 역량을 특정 소수분야에 집중토록 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켜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정부는 이를 전격 폐지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한데 따라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출자제한 철폐가 불가피했다"고 당시의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4월 이 제도를 전격 부활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자 대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98년 4월 17조7천억원이던 30대 그룹 출자총액이 99년 4월 29조9천억원으로 12조2천억원(68%) 늘어났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이 설비투자 부진 등 기업경기가 침체된 요인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지목,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자 산업자원부는 물론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출자제한 재고론'이 강력하게 대두됐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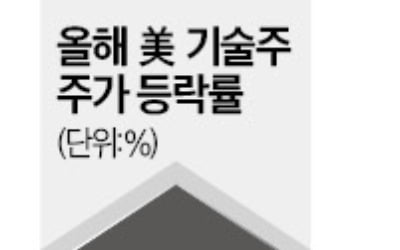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