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57
수정2006.04.02 19:00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지만 하나은행으로의 '낙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와 금융계의 한결같은 관측이다.
이로써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지 4년7개월만에 새 주인을 찾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은행 매각은 제일은행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은행 매각과정과 조건을 '헐값매각'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제일은행 사례와 비교해 본다.
◆ 가격 =하나은행이 제시한 가격은 약 1조원.
제일은행 매각대금 5천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당시 5천억원은 제일은행 주식지분 51%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매각대금은 각각 1조원으로 비슷하다.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전액을 현금이 아닌 주식('하나+서울' 합병은행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
제일은행 매각 당시 5천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현금과 주식중 어떤게 유리한지를 당장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금융계에는 주식매각 제한기간과 주가 위험 등을 감안할 때 현금이 훨씬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반해 정부측은 두 은행 합병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율을 확정할 순 없지만 두 은행의 최종 회수금액을 1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서울은행은 17.7%, 제일은행은 7.6%로 계산된다.
◆ 부대조건 =제일은행 매각 때와는 달리 풋백옵션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풋백옵션이란 일종의 '반품권리'.
인수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부실여신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매각자가 되사가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다.
제일은행은 3년간 풋백옵션을 보장, 결국 매각대금의 8배가 넘는 4조2천억원어치의 부실여신을 되사줘야 했지만 이번엔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다만 면책(indemnity)이 보장됐다.
소송패배 등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책임져 준다는 것.
그러나 이는 인수.합병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서울은행 실사 결과 금액 부담이 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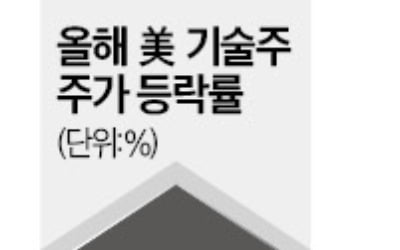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