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23
수정2006.04.02 18:27
1만엔대를 뚫고 내려간 닛케이평균주가가 버블경제 붕괴 후 최저치에 바짝 접근함에 따라 도쿄증시가 일본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시한폭탄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9천9백엔대에 머물렀던 닛케이평균주가는 26일 하룻동안 무려 3백38.88엔(3.41%)이 빠지면서 89년 말 이후 최저치(2002년2월6일,9천4백20.85엔) 경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미국증시 불안과 최근의 가파른 엔고가 주가를 끌어내린 최대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체력문제 등 내부요인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가하락이 경제 전반에 안길 충격은 지난 2월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불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가하락으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게 된 은행,생명보험사 등 금융권의 주가가 급락하고,이는 다시 증시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불안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굴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가하락이 두드러진 종목은 정보기술(IT) 등 하이테크 관련주와 자동차 등 일본의 수출 주력업종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소니는 2·4분기 영업이익이 5백19억엔으로 초고속의 회복세를 보였다는 발표가 25일 나왔음에도 불구,26일 10엔이 빠졌다.
자동차주식도 하반기 수출환경을 어둡게 보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은행은 대형 제조업체들의 금년 경상이익률이 지난해보다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엔화 값이 숨가쁘게 치솟은 후 증시 주변에서는 기대치를 대폭 수정했다.
국제증권의 미즈노 카즈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달러환율을 1백17엔 정도로 잡으면 증가율은 20%에 그친다"며 "하반기 수출이 난조를 보이면 한자릿수로 추락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금융권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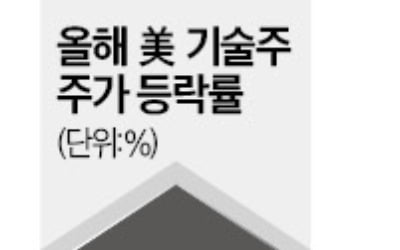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