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48
수정2006.04.02 13:50
'니프티-피프티(nifty-fifty)'는 지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우량종목 중심의 주가상승현상에서 나온 표현이다.
우리말로 하면 '멋진 50종목'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량(nifty) 종목 50개(fifty)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나머지는 철저히 소외받은 차별화 장세를 니프티-피프티라고 일컫는다.
코카콜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필립모리스 P&G 맥도날드 월트디즈니 등이 그 당시 대표적인 니프티-피프티종목으로 꼽혔다.
이들 주가의 PER(주가수익비율)는 시장평균의 2~4배에 달했다.
니프티-피프티 종목의 독주(獨走)가 가능했던 것은 기관화 장세 덕분이었다.
당시 기관들이 이들 대형우량주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유통주식수가 많아 대량 거래에 따른 부담이 적었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었으며 주주들의 감시가 철저해 경영 투명성이 확보돼 있어 투자책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런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고 일단 매수 후에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높은 배당과 주가상승이 보장된다고 해서 '한번만 결정하면 되는 종목', 즉 '원디시전(one-decision) 종목'이라고도 불렸다.
이런 장세가 펼쳐지면 증시에서 흔히 통용돼 오던 낙폭과대 종목을 노리거나 덜 오른 중저가 종목에 대한 길목 지키기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에서 니프티-피프티 장세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올들어 외국인의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반면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조(兆)원을 굴리는 연기금의 증시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니프티-피프티 장세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화려했던 멋진 50종목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에는 중소형 가치주들이 각광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이 경기회복의 초기단계이고 니프티-피프티들의 득세가 3~4년 지속됐다는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니프티-피프티 장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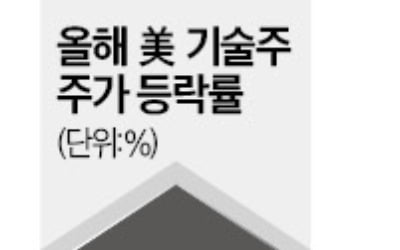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