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02
수정2006.04.02 09:05
"협상진행 과정에서 밝힐 만한 것은 공개해 국민 여론의 이해를 구하면 좋은데 당장의 비판이 무서워 말 못하는 거죠. 이처럼 실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니 협상팀은 거짓말하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들은 늘 ''포괄적 책임'' 문제를 의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팀에 힘이 실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모 정부 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윗사람''이 실무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두루뭉실한 결론을 내놓기 십상이라는 거지요. 윗사람은 명분에 집착하기 쉽고 다른 이해관계나 외부의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은 종종 무시됩니다"(한국외국어대 이광은 교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은 바로 ''책임과 권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지적들이다.
대외협상 담당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는 책임일 뿐 구체적인 책임 의식은 오히려 희박하다.
다시 말해 각론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이가 없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고 어떠한 점에서 판단을 잘못했으며 어떤 ''딜''에서 오류를 저질렀다"는 시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나 "상대 파트너에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 유감스럽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때우기 일쑤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무책임에 비기면 협상 담당자들, 특히 공직자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번 현대투신의 경우처럼 관(官)과 민(民)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을 경우엔 관이 절대 우월적인 지위에 서는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된다.
지난해 8월23일 양해각서(MOU) 체결 후 본계약 협상이 시작되면서 현대-정부의 주도권잡기 줄다리기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결정은 대개 정부(금감위) 몫.
그러나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협상과 관련된 보도라도 나오면 "협상은 현대와 AIG 협의사안"이라며 금감위는 손쉽게 발을 뺐다.
공무원 내부의 권한 설정과 책임 소재는 더욱 애매하다.
비전문가인 윗사람이 사안을 직접 다루는 실무자들을 억누르려 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협상과정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
정부의 대외협상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이광은 교수는 "국제협상 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권한의 배분이 전문 지식의 정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협상담당자와 실무 책임자,차상위의 관리자 사이의 권한 배분, 즉 책임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다보니 중구난방식의 협상이 되고 만다는 것.
협상의 노하우나 관련 문건, 협상내용과 주의점이 후임자에게 전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바로 이같은 ''권한-책임'' 문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후임자나 유관부서에 협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책임 시비의 화근을 남기는 것과 같고 따라서 바보소리 듣기 십상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과천 모 부처 과장은 "''고생 좀 하라''며 악수나 한번 하면 업무인계는 끝"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공식적인 문건정도나 전해질 뿐 업무와 관련된 살아있는 정보는 이렇게 사장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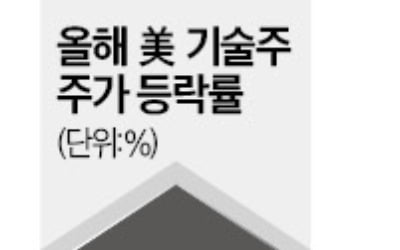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